확산되는 아날로그 열풍…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희경 기자의 컬처 insight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를 수 있는 일은 페이스북에서도 일어난다. 페이스북에는 하루에 한두 개의 사진이 올라오는 페이지가 있다.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습기 찬 버스 창문, 빈 김통이 덩그러니 있는 여백의 한 컷이다. 시시각각 수많은 글과 영상이 쏟아지는 이 플랫폼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올드(old)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무자극 컨텐츠 연구소’라는 이 페이지를 팔로한 사람은 5만4000여 명에 달한다. 눈과 손은 복잡한 디지털 세계에 있어도 여백이 있는 디지털 밖의 세상에 마음을 파묻고 싶어 하는 듯하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굳이 다이어리를 찾는 것처럼.
이들은 빈칸에 무엇을 채우고 싶은 걸까. 아마도 ‘잃어버린 자신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것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날로그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쁘게 공부나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다 잠드는 하루. 그 안에 갇혀 있던 이들이 잠깐의 끄적임과 멈춤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의미를 찾기 시작한 것이리라. 디지털 세계엔 없는, 아날로그만이 간직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해에는 《자존감 수업》 같은 책이 인기를 얻기도 했고, 글쓰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날로그 열풍으로까지 이어졌다.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턴테이블, 오디오 등도 대형서점 주요 코너에 자리했다. 아이유 등 유명 가수들이 발매한 한정판 LP도 완판됐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동네서점은 “한 주에 하나씩 생긴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급속히 확산됐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뚜렷한 종착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말이면 다이어리를 사서 새해가 시작되면 열심히 쓰기 시작한다. 하지만 한 해 꼬박 끝까지 다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작은 동네서점에까지 가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정작 독서량은 줄어들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연간 평균 독서량은 8.7권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9.6권이었다.
그러면 아날로그 열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다이어리 한 권을 다 쓰고, 책 한 권을 다 보지 않더라도 아날로그의 의미는 충분하다.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여행처럼 말이다. 행위의 완결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복원해 가는 시간이다. 몰입의 순간이 지층처럼 쌓이면 자아의 복원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첫 여행지처럼 길을 잃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지만. 잘못 쓴 글자, 흐릿한 사진 등이 그렇다. 하지만 아날로그는 원래 0과 1로 이뤄진 디지털과는 다르다. 불규칙의 선상에서 이뤄지는 게 본질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과정을 즐기며 아날로그에 더욱 빠져들고 있는지 모른다.
요즘 아날로그 열풍을 2012년 복고 열풍에 비유하기도 한다. 당시 사람들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을 보며 ‘삐삐’ ‘워크맨’ 등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상은 이때와 사뭇 다르다. 단순히 ‘노스탤지어(향수)’를 느끼려는 게 아니다. 노스탤지어엔 과거의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 과거의 아날로그에서 현재의 나를 깨우기 시작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아마존, 혁신의 아이콘인가 독점 괴물인가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4410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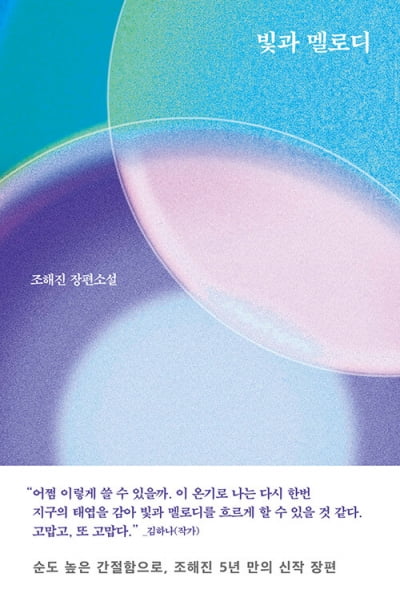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