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검진사업 '혈세 낭비' 논란…양성 판정 받고도 80%는 치료 원치 않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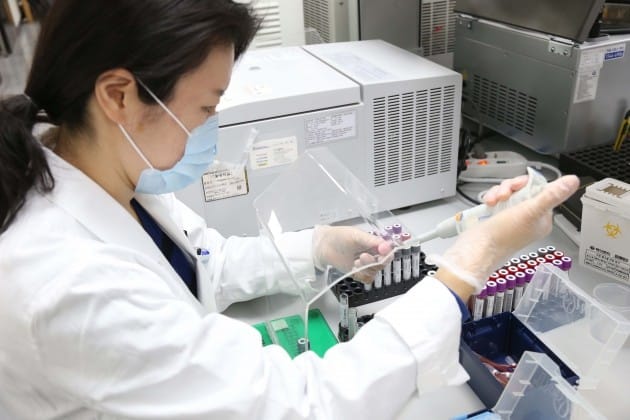
정부는 결핵 퇴치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의료기관·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고교 1학년 및 교원 등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했다. 미리 잠복결핵균을 치료해 결핵 발병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에 98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서울시의 경우 피검자 14만7529명 중 양성인 사람은 2만3877명이었다. 이 중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7.1%인 1715명에 불과했다. 부산시는 피검자 4만9577명 중 754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치료 희망자는 1252명으로 양성자 전체의 16.6%에 그쳤다. 인천시도 양성자 5633명 가운데 14.2%인 802명만 치료를 희망했다.
보건당국은 잠복결핵 치료를 의무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잠복결핵 양성자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항결핵제가 피부, 신장, 간 등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무조건 치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검진 정책의 목적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은 대중과 자주 접하는 사람이 결핵 보균자라는 점을 인지하게 해 결핵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감기로 착각하고 무감각하게 행위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당사자가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해명했다.
정책 취지는 좋으나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잠복결핵 사업은 대상을 선별해 이뤄진다. 의료인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과 에이즈 당뇨 암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그런데 이번 검진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교정시설 재소자, 고교생 등을 포함한다.
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검진 대상을 너무 확대해 진단과 치료의 연계가 약해졌다"며 "검진의 집중도가 떨어져 양성자로 판명된 사람의 치료 순응도가 나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건당국은 축적한 검진 자료를 결핵 관리와 예방에 쓸 계획이다. 질본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검진 일정이 달라 아직 전국 단위 통계를 완성하지 못해 의료기관 수치를 포함한 전수 조사 통계는 심평원 등 자료를 분석해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양성자의 치료 여부, 결핵 발병 여부 등을 10년에 걸쳐 추적 관찰하는 코호트 구축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伊 우주 영웅 마우리치오 켈리 "한국 우주인 만나길 고대" [강경주의 IT카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36924.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