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김일성과 담판 성공했으나
김 주석 사망으로 물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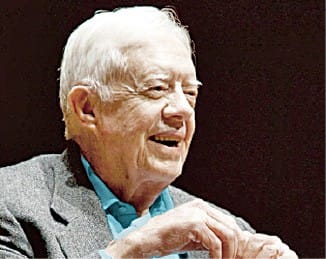
카터는 1977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당시 3만 명에 이르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다. 그는 책에서 “당시 한국은 경제력으로나 기술력으로나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북의 국력 차가 확대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이 양호했다는 것이다. 그는 “헤럴드 브라운 국방장관 및 다른 보좌관들과 함께 미군을 감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에서 당시 미군 소장이던 존 싱럽이 감축안에 반대한다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미 국방부 정보부서가 북한의 군사력을 갑자기 두 배로 늘린 평가서를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정보에 매우 회의적이었으나 보고서가 의회 지도자들과 공유됐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승인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며 미군 철수 뜻을 굽힌 배경을 설명했다. 싱럽 소장은 당시 이 성명을 부인하며 “한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서렸던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김일성 북한 주석과 벌인 담판 부분도 흥미롭다. 당시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의무조항을 무시하고 핵 시설에서 감시단을 철수시키고, 사용한 우라늄 연료봉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과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사안을 넘겨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은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일부라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3년에 걸쳐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가까스로 승인을 받고 방북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은 서글서글하고 놀라울 정도로 모든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국제사찰단의 조사 허용, 남한과의 정상회담, 비무장지대에 전진 배치한 군대의 철수, 6·25전쟁 중 전사한 미군의 유해송환 문제 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