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처리지침 전달하는데 사흘 걸린 지자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팩스 하나 달랑 보내놓고
"할일 다했다"는 구청
폐기물 수거 안내문
안붙인 자치구도 수두룩
"할일 다했다"는 구청
폐기물 수거 안내문
안붙인 자치구도 수두룩
환경부와 서울시, 시 산하 자치구 대부분이 폐비닐 등 수거 업자들의 ‘집단태업’에 따른 혼란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고유 업무도 방기한 채 떠넘기기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부분 구청은 지난주 환경부로부터 “일부 지역 아파트에 붙은 ‘폐비닐 수거 불가’ 공지문은 관련 규정에 반하므로 즉각 폐기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수거 업자들이 ‘돈이 안 된다’ 또는 ‘(정화)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용역계약 업무를 포기한 집단태업 성격이 짙은 만큼, 아파트 등 관리 업체가 수거 업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적은 공지문을 붙인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은 종량제봉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분리 배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청은 이 같은 지침을 3~4일간 묵살한 뒤 뒤늦게 일선 아파트 단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청은 지난 금요일(30일) 팩스 한 장을 보내놓고 이후 별다른 조치나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다. 폐기물처리 업체들의 사업자 인가, 관리감독 권한은 구청에 있다.
업체들이 부당한 담합 또는 태업을 할 경우 인가 취소 방침을 통보하거나 대체 사업자를 물색하는 등 ‘적극적 자치행정’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럼에도 각 구청은 이날까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만 했다.
서울시의 한가한 행보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청을 지휘할 방안을 찾아야 할 서울시는 이날도 “사태 파악이 먼저”라며 환경부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산하 25개 기초자치단체 행정기능이 ‘쓰레기 대란’ 앞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 개헌안 등 일각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자치행정·자치분권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부터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경고됐는데도 뒷짐 진 환경부의 업무 태만도 지적된다. 환경부는 2016년 재활용시장 붕괴에 따른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연구영역 보고서를 받고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에서야 각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진우/이해성 기자 jwp@hankyung.com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부분 구청은 지난주 환경부로부터 “일부 지역 아파트에 붙은 ‘폐비닐 수거 불가’ 공지문은 관련 규정에 반하므로 즉각 폐기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수거 업자들이 ‘돈이 안 된다’ 또는 ‘(정화)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용역계약 업무를 포기한 집단태업 성격이 짙은 만큼, 아파트 등 관리 업체가 수거 업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적은 공지문을 붙인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은 종량제봉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분리 배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청은 이 같은 지침을 3~4일간 묵살한 뒤 뒤늦게 일선 아파트 단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청은 지난 금요일(30일) 팩스 한 장을 보내놓고 이후 별다른 조치나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다. 폐기물처리 업체들의 사업자 인가, 관리감독 권한은 구청에 있다.
업체들이 부당한 담합 또는 태업을 할 경우 인가 취소 방침을 통보하거나 대체 사업자를 물색하는 등 ‘적극적 자치행정’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럼에도 각 구청은 이날까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만 했다.
서울시의 한가한 행보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청을 지휘할 방안을 찾아야 할 서울시는 이날도 “사태 파악이 먼저”라며 환경부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산하 25개 기초자치단체 행정기능이 ‘쓰레기 대란’ 앞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 개헌안 등 일각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자치행정·자치분권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부터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경고됐는데도 뒷짐 진 환경부의 업무 태만도 지적된다. 환경부는 2016년 재활용시장 붕괴에 따른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연구영역 보고서를 받고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에서야 각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진우/이해성 기자 jwp@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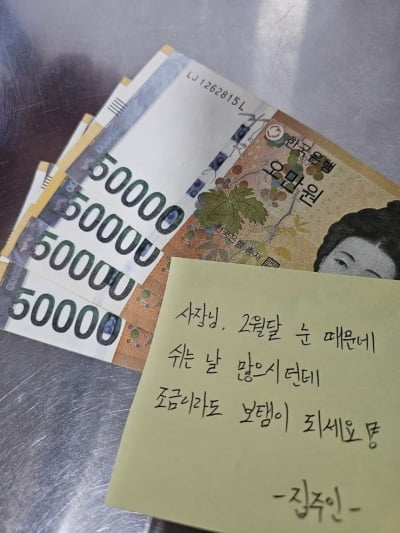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