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이대리] 막 오른 프로야구, 웃거나 울거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물 만난 야구광
"까칠한 부장님이 달라졌어요, 같은 팀 좋아해서 ㅎㅎ"
괴로운 야구 '꽝'
"대화 못 끼는 건 예사…단체응원 가선 병풍이죠"
"까칠한 부장님이 달라졌어요, 같은 팀 좋아해서 ㅎㅎ"
괴로운 야구 '꽝'
"대화 못 끼는 건 예사…단체응원 가선 병풍이죠"
![[김과장&이대리] 막 오른 프로야구, 웃거나 울거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AA.16486963.1.jpg)
갈수록 높아지는 인기에도 프로야구 시즌을 맞이하는 김과장 이대리들은 희비가 엇갈린다. 겨우내 손꼽아 기다려온 ‘야구광’에게는 ‘천국’이, 야구 얘기가 재미없고 지겨운 ‘야알못(야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시작된 셈이다.
야구는 삶의 활력소
화장품 회사 영업사원인 김 과장은 야구 개막 이후 활기를 되찾았다. 기아 타이거즈 광팬인 그는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남자다. 프로야구 경기 시간이 되면 피곤함이 싹 사라진다. 영업사원 특성상 외근이 많은 김 과장은 업무를 핑계 삼아 몰래 원정경기까지 보러 간다. 그는 “목놓아 남행열차를 부를 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웃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윤 대리는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성덕(성공한 덕후)’으로 불린다. 고등학교 때부터 응원하던 야구팀과 같은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이다. 윤 대리는 개막전이나 어린이날 시리즈처럼 야구팬이 몰려 예매하기 어려운 경기도 쉽게 예매한다. 직원들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내 이벤트 등을 활용하면 유니폼이나 야구점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윤 대리는 “직장 상사와 같은 팀을 응원하다 보니 업무 외에 또 다른 공감대가 생겼다”며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직원들이 느끼지 못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다 보니 애사심도 커졌다”고 했다.
![[김과장&이대리] 막 오른 프로야구, 웃거나 울거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01.16490905.1.jpg)
‘우리가 남이가’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면서 회사 내에서도 응원하는 구단에 따라 편이 갈린다.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허 과장은 야근 중에 컴퓨터로 야구 중계를 보다가 팀장에게 들켰다. 일하는 도중에 딴짓을 하다가 걸린 만큼 팀장의 잔소리를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눈치를 살피던 도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팀장의 눈빛이 따뜻하게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팀장도 같은 구단을 응원하는 프로야구 광팬이었던 것. 이후 팀장은 허 과장과 절친 사이가 됐다. 응원하는 팀이 연패에 빠질 때면 서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평소 업무로 상사의 지적을 많이 받던 문 과장은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오면 최 부장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같은 두산 팬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전날 두산 베어스의 성적에 따라 최 부장의 기분이 오락가락하지만 ‘두산 팬’이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야구 시즌에 유독 그가 너그러워지는 게 느껴진다.
“제 응원팀이요? 본부장님과 같습니다!”
야구팀을 운영하지 않는 회사 직원들도 응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관련 제조기업에 다니는 김 대리는 작년부터 반강제로 국내 프로야구 리그 A팀의 경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부서 내 부장부터 상무, 같은 층의 전무까지 ‘윗분’들이 모두 그 팀을 응원해서다. A팀을 운영하는 기업은 김 대리의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고 지역 기반도 달랐지만 팬층은 두터웠다.
의아해하던 김 대리는 최근 직원 단체 야구 관람 행사를 다녀온 뒤 궁금증이 풀렸다. 맥주 뒤풀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 오너 아들인 모 임원이 A팀 팬”이란 얘기를 들었다. 김 대리는 “오너 아들이 임원에 오른 몇 년 전부터 그 팀을 응원하는 이들이 확 늘었다”고 말했다. “A팀 열혈 팬인 줄 알았던 박 부장님은 야구의 기본 규칙도 잘 모르더라고요. 김 상무님은 경기를 보다 거의 졸았고요. 알고 보니 다들 ‘야구팬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좀 씁쓸했습니다.”
자칫 상사와 다른 팀을 응원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야구팀을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는 민 과장은 야구 시즌마다 상사인 박 부장 눈치를 보느라 편할 날이 없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응원팀이 다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직장 상사와 부서 회식을 겸해 회사팀과 응원팀 간 경기를 보러 간 것이 화근이었다. 응원팀이 역전하자 술 기운이 적절히 오른 민 과장이 벌떡 일어나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른 것. 이후 박 부장은 민 과장을 볼 때마다 넌지시 응원팀의 성적을 물으며 눈치를 줬다. “회사팀이 지고 난 다음 날이면 유독 지시사항과 지적사항이 늘어나는 기분입니다. 차라리 응원하는 팀이 지는 게 속이 편할 정도입니다.”
야알못에게 돔구장이라니
‘야알못’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괴롭다. 지난 6일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탓에 사상 최초로 경기가 전격 취소되던 날 속으로 만세를 불렀을 정도다. 회사에서 하루종일 야구 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야구 회식까지 하자는 통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직원들끼리의 수다 주제가 야구로 쏠려 식사 시간에 대화에서 소외되는 건 예사다. 문제는 경기 단체관람에 동원되는 일이 잦다는 것. 한 대기업에 다니는 A대리는 조만간 열리는 자사 구단의 평일 저녁 야구 경기에 강제 참석하게 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오후 3시께 단체로 퇴근해 삼삼오오 장을 보고 구장으로 가는 일정이다. 말은 ‘선택’이지만 사실상 ‘무조건 필참’이다. 회사 구단 경기를 직원들이 단체 관람하는 건 회사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나면 단체 회식이 이어진다. 대화 주제는 당연히 그날의 경기. A대리 같은 ‘야알못’은 여기서도 ‘병풍’이 된다. “고척스카이돔으로 예정된 경기가 최악입니다. 유일한 희망이 ‘우천 취소’인데 돔구장은 그걸 바랄 수도 없으니까요.”
야구는 사랑을 타고
제조회사 직원 김모씨는 야구 경기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올해 들어서만 이미 두 차례 경기장에 다녀왔다. 경기 중간에, 혹은 경기가 끝난 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말을 걸어 즉석 미팅을 하는 ‘야구장 헌팅’에 푹 빠졌다.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발견하면 적당한 타이밍에 말을 걸어 맥주 약속을 잡는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아무래도 경기에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돼 소재가 고갈될 일이 없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요. 경기도 보고, 연애할 기회도 찾고 일석이조죠.”
패션업계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완벽한 ‘야알못’이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야구장에 가자고 하면 질색부터 했지만 최근엔 “시간이 맞으면 가겠다”고 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야구장에서 즐긴 ‘삼맥(삼겹살+맥주) 타임’이 꽤 즐거웠기 때문이다. “요즘 야구장에는 웬만한 맛집 거리 못지않게 먹을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응원가를 따라 부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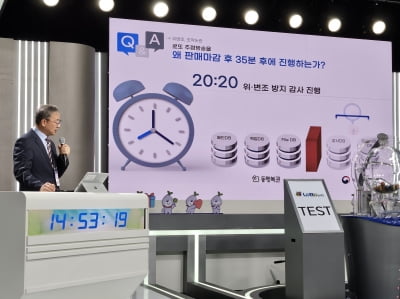
!["로또 조작 못하겠네"…추첨기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329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