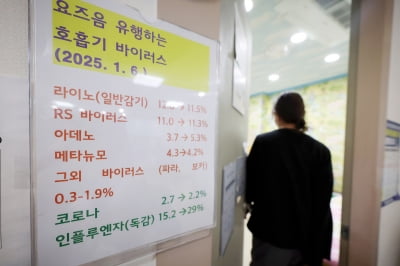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난사 때 몸으로 총알을 막은 체육교사를 온 나라가 추모했다. 지난해 12월 뉴멕시코주 고교 총격사건에선 교실문을 가구로 막아 범인을 차단한 74세 할머니 교사가 널리 소개됐다. 총기사고마다 이런 교사가 한둘은 꼭 나온다.
2001년 9·11테러 때 2687명을 살리고 정작 본인은 목숨을 잃은 모건스탠리의 보안책임자 릭 레스콜라를 세계적인 위인으로 치켜세웠다. 테러 희생자(2606명)보다 진화·구조에서 숨진 경찰관, 소방관을 ‘영웅’으로 예우한다.
대형 재난이 터질 때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이 앞장 서 영웅을 만들어낸다. 그러다보니 과장이나 오보도 적지 않다. 영웅인 줄 알았던 교사가 실은 겁쟁이였다는 폭로가 나오고, 9·11 구조에 참가한 전직 경찰·소방관들이 후유증을 위장해 장애연금을 챙겨 발칵 뒤집힌 적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인들은 ‘영웅 만들기’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절실했던 혹독한 개척사에다, ‘인종의 샐러드볼(bowl)’이라는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깔려 있다. 영웅이 많을수록 다른 재난에 더 많은 영웅이 나올 것이다.
이런 특성은 카를 융의 ‘상징적 인간(Homo Symbolicus)’이란 관점과도 통한다. 원시벽화부터 신화, 종교 등의 ‘상징(symbol)’은 집단을 하나로 묶는 끈 역할을 했다. 영웅도 그런 심벌인 셈이다. 할리우드 영화에 유독 히어로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미국과는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예고된 인재(人災)’, 책임자 처벌 요구 등으로 난리가 난다. 언론은 ‘희생양’ 찾기에 혈안이고, 관료들은 납작 엎드릴 뿐 시스템 개선은 뒷전이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잊지 않겠다”면서 구조하다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이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는 오랜 농경사회 전통과 무관치 않을 듯싶다. 원인에 관계없이 재난·사고를 촌락공동체의 질서를 깬 것으로 간주해 누군가의 대가를 요구했다. 게다가 왕들은 영웅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순신과 수많은 의병장의 비참한 말로가 그 증거다.
지금도 공(功)보다 과(過)만 부각시켜 영웅을 끝내 ‘일그러진 영웅’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영웅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드는 사회는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결코 클 수 없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한경에세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9080874.3.jpg)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추위와 대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29648277.3.jpg)
![[천자칼럼] LA 화재 불씨는 낡은 美 전력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1078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