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의 이름으로
양건 지음 / 사계절 / 620쪽 / 2만6000원
양건 지음 / 사계절 / 620쪽 / 2만6000원
![[책마을]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AA.16795477.1.jpg)
이처럼 헌법은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선언하는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87년 헌법 체제’를 수립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등 각계각층에서 새 헌법에 대한 요구가 넘쳐나고 있다.
법과사회이론연구회장, 한국공법학회장 등을 지낸 양건 전 감사원장의 신간 《헌법의 이름으로》는 한국 헌법의 특징과 역사뿐 아니라 최근 헌법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헌법은 ‘규칙’보다 ‘원리’가 많은 법이라고 설명한다.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처럼 시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규칙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같이 추상적이어서 광범위하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조항이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헌법의 특성 때문에 헌법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재판’을 통해서만 헌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또 헌법재판 결과에는 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왔다는 게 저자의 논리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등을 예로 들며 저자는 “두 결정 모두 헌법 해석에 당시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부침을 반복하는 여론이 아닌 헌법 속에 내재된 국민 의사”라고 덧붙인다.
그는 “헌법은 제정뿐만 아니라 해석과 적용 역시 매우 정치적”이라며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그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 될 뿐”이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정치권의 주요 논쟁거리인 개헌 필요성도 분석한다. 그는 “‘87년 헌법’ 이후 대통령의 권한 남용, 국회·대통령 간 대립으로 국정 정체가 반복돼왔다”며 “정치권력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판단을 구하는 등 사법통치 경향이 심화됐다”고 지적한다. 그는 각종 폐해를 낳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사법기관의 대통령 견제권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 인사제도 개혁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한 헌법 조문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권위주의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헌법은 해석과 재해석의 과정을 무수히 거치며 새롭게 쓰여진다는 점에서다. 그는 “새로운 헌법질서를 세우는 일이 헌법전 조문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개헌은 추진해야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헌법질서를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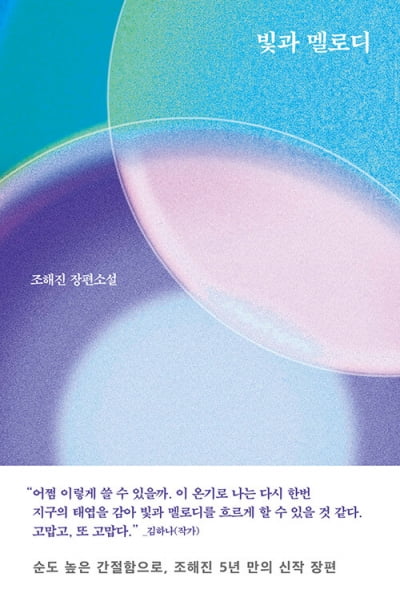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