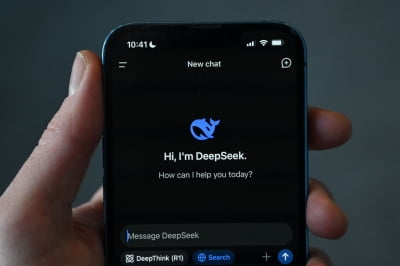10단 자동변속기 첫 장착
균형감 좋은 2.3
5.0은 성난 야수
강력한 힘과 가속력
정교한 핸들링 부족해

지난 8일 강원 인제스피디움에서 뉴 머스탱을 몰아봤다. 강력한 성능과 특유의 거친 주행 질감이 인상적이었다. 시승 차종은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얹은 모델과 힘이 가장 뛰어난 GT 두 가지였다.
◆ 균형 잡힌 2.3 에코부스트 쿠페
뉴 머스탱은 자세히 뜯어보면 큰 변화를 줬다. 새로운 디자인의 전면부 범퍼와 LED(발광다이오드) 헤드램프, 크기를 줄인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체가 낮고, 넓게 보이도록 했다. 고속주행 때 공기의 소용돌이를 없애는 리어 스포일러 등도 특징이다.
실내 인테리어는 기존 큰 틀을 유지하고 실속을 더했다. 12인치 액정표시장치(LCD) 계기판은 성능 게이지와 여러 색상 등을 운전자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운전석에 앉자 낮은 시트 포지션이 느껴졌다. 한껏 부풀어 오른 후드(보닛)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가죽 시트는 온몸을 편안하게 감싸안았다. 가속 페달을 밟자 ‘그르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치고 나갔다.
2.3 에코부스트 모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균형’이었다. 계기판 속도계는 부드럽게 올라가 순간 시속 140㎞를 넘어섰다. 힘이 넉넉해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겠다는 느낌이다. 이 차는 최고 출력 291마력, 최대 토크 44.9㎏·m의 성능을 낸다.
특히 브랜드 최초로 장착한 셀렉트 시프트 10단 자동변속기가 큰 안정감을 줬다. 촘촘한 기어 단수는 엔진의 힘을 바퀴로 빈틈없이 전달해 줬다. 급격한 코너 구간을 돌아 나가도 단단한 하체가 끝까지 한계점에서 버텨냈다.
동승한 카레이서는 “변속기가 주행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뉴 머스탱은 고속 회전 시 뒷바퀴가 밀리는 ‘오버 스티어’ 성향을 극복해 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운전대) 반응 정도, 배기음까지 조절할 수 있어 운전하는 즐거움이 컸다. 다만 독일산 고성능차의 강점인 정교한 핸들링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편이었다.

주행 성능을 높인 GT 모델은 처음 봤을 때 아쉬움이 컸다. 심장(엔진)부터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으나 뚜렷한 개성이 부족했다. 이탈리아 브렘보의 디스크 브레이크와 리어 윙, 엔진오일 쿨러, 전용 배지 등 차별화 요소는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존재감이 한껏 드러났다. 특유의 근육질 디자인은 남성미를 물씬 풍겼다. 숨어 있던 엔진이 거친 숨을 푹 내쉬었다. 커다란 북을 치는 듯 굵고 심장을 뛰게 하는 배기음은 ‘야수’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서킷으로 들어서 가속 페달을 살짝 밟자 야생마처럼 쏜살같이 튀어나갔다. 조금만 세게 밟아도 상체가 뒤로 젖혀졌다. 눈 깜짝할 사이 시속 160㎞에 도달했다. GT 모델은 5.0L 8기통 엔진을 탑재해 최대 토크가 54.1㎏·m에 달하며 446마력을 도로 위에 쏟아낸다.
실제 운전대와 발끝으로 자연흡기 엔진의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이어서 ‘섬세한 조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 차는 헤어핀 코너를 돌아나갈 때 어느 정도 차체가 미끄러지는 재미를 줬다. 몇 초 뒤에는 곧바로 자세를 잡아줘 달리는 즐거움을 키웠다. 미국차만이 가진 주행 질감이었다. 이 밖에 트랙 드래드 주행 모드 등을 지원한다.
뉴 머스탱은 문이 두 개인 쿠페와 지붕이 열리는 컨버터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판매 가격은 트림(세부 모델)별로 4800만~6940만원이다.

머스탱은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카로 불린다. 긴 털의 꼬리를 휘날리며 달려나가는 야생마 엠블럼은 미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1964년 처음 출시된 머스탱은 1년6개월 만에 100만 대가 팔려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석유 파동이란 직격탄을 맞은 2세대 머스탱은 1974년 엔진 다운사이징(엔진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은 유지) 기술로 변화를 시도했다.
1979년과 1994년에는 각각 3세대 4세대가 나와 명맥을 이었다. 굵은 직선과 옛 디자인을 되살려 2005년 나온 5세대는 누적생산 9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영광을 재현했다. 지금은 2014년 첫선을 보인 6세대의 뉴 머스탱이 판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