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 산업 키우려면…기업에 자율성 주고 책임 물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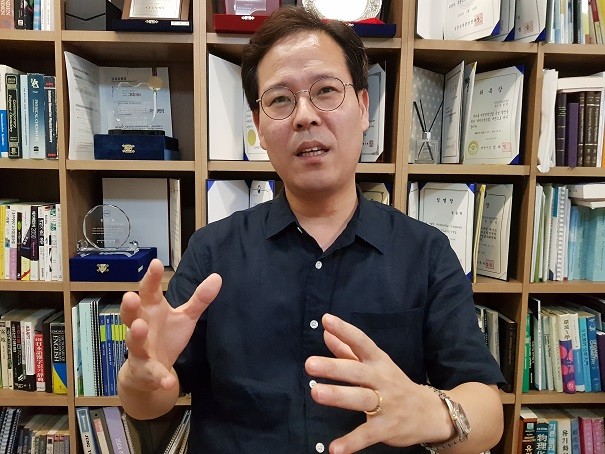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49)은 한국 바이오·제약산업의 잠재력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내 대형 바이오기업의 시가총액은 크지만 매출은 아직 그에 못미친다”며 “제조업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일군 성공 사례를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1998년 서강대 화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2011년 고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종근당, ㈜CJ, 건일제약 등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7~2016년 제약산업지원단장으로 일했다. 현재 차의과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겸임교수, 미국 약전위원회(USP) 한국컨설턴트,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헬스MBA과정 겸임교수, 중앙대 제약산업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원장은 “미래 세계 경제를 바이오·제약산업이 주도할 거라는데 전문가들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에서 바이오·제약산업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게 정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의 R&D 지원금이 연간 20조원 가까이 되지만 이 가운데 바이오·제약 분야 비중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도 4000억원이 안 된다”며 “이 분야 지원을 중요도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픈이노베이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뭘 해야할까. 정 원장은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이 한국에 사무소를 내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진출을 많이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시너지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원장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직접 사무소를 내고 국내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며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등 이 분야 강국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바이오산업을 키웠다”고 말했다.
“신약 개발은 보통 10년이 넘게 걸리고 돈도 수십조원 들기 때문에 개발을 함께 할 글로벌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은 한국에 마케팅 사무소만 냈지 R&D 협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아요.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한국 사무소를 낸 곳은 존슨앤드존슨, MSD, 사노피 등 3곳에 불과하죠. 세금 감면 같은 것 말고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도록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바이오·제약산업 규제 완화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정 원장은 “한국은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등을 보면 기업이 물건을 잘못 만들었을 때도 정부에게 관리 부실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분위기는 공무원이 규제를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매우 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한국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속보] 오픈AI·카카오 전략적 제휴…카나나 등 서비스에 오픈AI 기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ZA.39401146.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