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통일은 멀고 위기는 코앞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수진 국제부 차장
![[편집국에서] 통일은 멀고 위기는 코앞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07.14315371.1.jpg)
호황 속 미국 경제의 단면이다. 세븐일레븐 앞뿐만이 아니다. 미국 전체가 활기로 가득하다. 주가와 성장률 등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실물 현장에서도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의 훈풍을 느낄 수 있다. 늘어난 고용이 소비와 물가를 자극해 생산과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는 ‘선순환 궤도’가 완연히 자리잡았다. 2분기 4.1% 성장(연율 기준) 성적표를 받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분기엔 5%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호언하고 있다. 여세를 몰아 내년 7월까지 최장 경기확장 기록(120개월)을 갈아 치우겠다는 기세다.
커지는 미국 경제 과열 경고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미국 경제 과열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3년 뒤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느긋한 분석(국제통화기금)도 있지만, 당장 내년 10월이면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탈 것이라는 경고(월스트리트저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가 감세 등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과열 우려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기가 꺾인다 해도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위기로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직 미국이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의치 않으면 달러를 찍어 경기 부양을 더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교역국들의 팔을 비틀어 ‘제2의 플라자합의’ 같은 양보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조윤제 주미 대사는 그의 저서 《위기는 다시 온다》에서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는 모두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찾아왔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1986년과 1994년, 2004년에 각각 금리 인상 레이스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매번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그때마다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의 고통은 20년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정부의 안이한 '통일 한방론'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이 최근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작’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도 사정권 밖은 아니다. 경제는 사상 최대 수준의 가계 부채와 소비·투자·수출 하락이라는 ‘3중고(重苦)’로 외부 충격에 한껏 약해져 있다.
정부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제대로 된 경제성장 비전이나 금융대책 없이 오직 ‘통일 한 방론’에 기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통일경제특구 등을 제안하면서 “통일과 남북교류가 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사실 통일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황당한 발상을 계속하는 게 아니냐”(현직 고위 공직자)는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은 그의 신작 《트럼프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전 국무장관) 같은 기득권층을 이긴 이유는 그들이 기후변화 같은 뜬구름 잡는 이슈에 집착할 때 일자리 같은 현안을 챙겼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통일은 멀고, 경제 위기는 코앞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는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다.
psj@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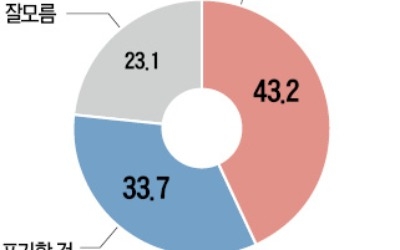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