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드라마·영화·뮤지컬… '텐트폴 시대' 빛과 그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희경 기자의 컬처 insight
제작비 수백억 '한 방' 승부
소외받는 중소 콘텐츠 늘어
시장 다양성 해칠 우려
제작비 수백억 '한 방' 승부
소외받는 중소 콘텐츠 늘어
시장 다양성 해칠 우려

올여름 문화계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텐트폴(tent pole)’ 작품들과 그 제작비다. 텐트폴은 텐트를 칠 때 사용하는 지지대다. 문화계에선 각 제작사의 한 해 사업 성패를 가를 대작을 뜻한다.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만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다. 유명 감독과 스타들을 대거 내세워 화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 나온 작품들도 마찬가지다. 공개 전부터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예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미스터 션샤인은 tvN 역대 드라마 첫 방송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인 8.9%를 기록했다. 지난 12일엔 13.4%에 달했다. 신과함께는 1, 2편이 나란히 관객 1000만 명 이상을 끌어모아 ‘쌍천만’ 작품이 됐으며, 공작은 신과함께와 박스오피스 1위를 다투고 있다. 웃는 남자는 국내 공연계에서 최단 기간인 한 달 만에 누적 관객 수 10만 명을 돌파했다.
텐트폴 전성시대다. 주로 영화 시장에서 제작됐던 텐트폴 콘텐츠는 드라마, 공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00억원대 수준이었던 텐트폴 제작비도 300억~4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가시적인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다. 대중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거액 투자에 따른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비책이 없이 앞다퉈 판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텐트폴로 성장한 대표적인 제작사로 ‘월트디즈니’가 꼽힌다. 디즈니는 5년 단위로 텐트폴 제작과 예산 계획 등을 촘촘하게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흥행몰이에 나선다. 디즈니가 성공하자 미국, 유럽 등지의 많은 제작사가 이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국내에선 2002년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처음 제작비 1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이후 뜸했다가 2014년 200억원을 들인 ‘명량’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텐트폴 제작이 활성화됐다.
각 분야 제작사들이 텐트폴에 힘을 쏟는 건 한 번에 수익성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제작사들은 보통 연간 예산의 70% 정도를 텐트폴에 쏟는다. 다른 작품이 흥행하지 않더라도 텐트폴 하나가 성공하면 손실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증권사들도 상장된 제작사의 주가 전망을 내놓을 때 꼭 해당 텐트폴의 가치와 효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 제작사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같은 시기 개봉한 운 나쁜 작품들은 ‘슬리퍼 히트(Sleeper Hit)’가 될 기회조차 잃어버린다. 슬리퍼 히트는 흥행할 줄 몰랐는데 의외로 큰 호응을 얻는 작품을 이른다. 화려한 대작들에 자주 노출된 대중의 감성은 작은 콘텐츠가 주는 울림에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유혹은 자칫 흥행 참패 시 비수가 돼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많은 기대를 한 만큼 실패의 기억도 다른 콘텐츠보다 깊이 각인된다. 160억원을 들였으나 외면받은 영화 ‘인랑’의 실패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hkkim@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경찰팀 리포트] '국경 없는' 몸캠피싱 범죄… 美·英 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소탕](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AA.1754412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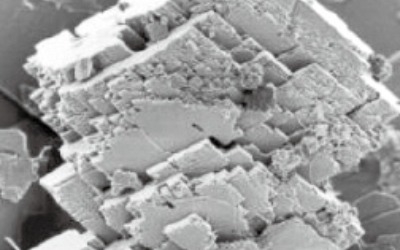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