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혈액제제·백신 대신
혁신 신약후보 물질 발굴
실패 확률 높은 물질은 포기
"2023년까지 4개 신약 임상"

◆신약 개발을 향한 의지
GC녹십자가 실험적으로 RED라는 연구조직을 가동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RED는 초기 연구개발을 뜻하는 ‘Research & Early Development’의 줄임말이다. 기존 연구조직과 별도로 신약후보물질 발굴에서 초기 임상까지만 담당한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GSK의 DPU(Drug Performance Units), 일라이 릴리의 코러스(Chorus), 제넨텍의 gRED가 대표적인 예다.
RED에 대한 구상은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에게서 나왔다. 허 사장은 1년 전부터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해 자체 컨설팅을 했다. 그 결과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출혈성 혈액 질환, 대사성 희귀질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GC녹십자가 유전자재조합 혈우병A 치료제인 ‘그린진에프’와 희귀병인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를 개발한 경험이 있어서다.
그러나 사내에는 이미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별도팀이 존재했다. 허 사장은 신약이 GC녹십자의 주축을 이루는 혈액제제 및 백신 사업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데 주목했다. 빠른 의사 결정과 조직 변화를 위해 독립적인 연구조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류준수 GC녹십자 RED 본부장은 “틀부터 달라야 혁신적인 신약이 나올 수 있다”며 “RED는 기존 정형화된 조직 형태와 프로세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패확률 높은 프로젝트 ‘포기’
GC녹십자는 연구개발, 공정개발 등 흩어졌던 기능을 RED 본부에 통합했다. 본부는 30여 명의 연구원으로 소규모로 꾸려졌다. 압축된 목표에 집중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프로젝트 오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는 희귀질환, 혈액학, 개발전략팀, 공정개발, 공정연구 등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됐다. RED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5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D는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보물질의 개념검증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실패 위험이 높은 약은 과감히 포기하고 가능성이 높은 약을 골라내 개발하는 ‘퀵 윈-패스트 페일(quick win, fast fail)’ 전략이다.
약물 개발 과정에서 비임상부터 임상 1상까지의 초기 비용은 임상 전체 투자금의 10% 미만이다. 금액이 현격히 늘어나는 임상 2~3상 전에 ‘싹수’가 없어 보이는 후보 물질을 빨리 잘라내 기회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RED는 신약후보물질 중 실패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주저 없이 레드카드를 내밀고 퇴장시키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GC녹십자는 희귀질환군 가운데서도 해당 분야 최초 신약만 개발할 계획이다.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시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RED는 임상 1상까지 네 차례 심의 단계를 거치던 기존 내부 절차도 간소화했다. 비임상과 임상 1상 진입 때 각각 한 번씩만 하는 대신 심의 기준을 높이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3년 뒤인 2021년 1건 이상의 신약 임상시험계획(IND)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겠다는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2023년까지 4개 이상 신약 임상 승인을 받고 1건 이상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RED의 실험이 성공해 2027년에는 GC녹십자가 개발한 제품이 상용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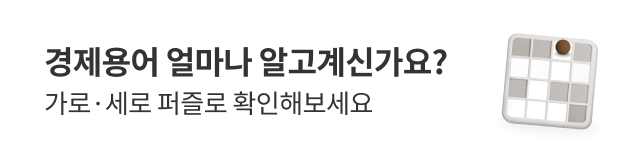
![[한방 건강상식] 늦여름, 골다공증에 관심 가져야 할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01.1756119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