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납품 업체들은 10억원 못 받아…조직위·원도급업체 '책임 떠넘기기'

그런데 아직도 공사대금을 못 받아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올림픽 기간 사용된 임시시설물 설치에 참여한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2일 평창올림픽조직위 사무소 앞으로 남성 30여 명이 모여들었다.
평창올림픽 설상경기장에 그랜드스탠드(임시관람석)를 공급·설치한 하도급업체 50곳의 대표들이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지 5개월.
업체 대표들은 좀처럼 돈을 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날 조직위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0억원에 이르는 대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 50개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그랜드스탠드 구조물 제작과 공급, 설치, 해체, 철거를 도맡았다.
대책위는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성공올림픽에 기여했으나 조직위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며 대회가 끝난 지 5개월이 넘도록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와 조직위에 따르면 그랜드스탠드 공급계약 금액은 86억원으로 문제는 계약금액 외에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로 발생한 107억원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대회 전 조직위에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요청했고, 조직위는 하도급업체들에 이를 이행해달라고 했다.
하도급업체들은 급작스러운 추가나 변경 업무가 수시로 발생해 80억여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원도급업체 역시 27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체들이 주장하는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은 모두 107억원이 됐다.
하도급업체들은 "그랜드스탠드 사업에 수많은 비용과 인력, 장비가 투입됐으나 조직위의 대금 미지급으로 노동자들은 생계위협을 받고 있으며, 업체는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직위는 애초 계약금액보다 큰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A 업체가 설계도서가 합의되지 못한 채 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황을 악용해 조직위가 수용할 수 없는 수량·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시도를 반복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공사대금에 대한 대책위와 조직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조직위는 "분쟁조정 종결 후 협의가 끝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책위는 "감리단과 대형법무법인을 내세워 삭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못 미더워하고 있다.

업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받지 못한 금액만 10억여원. 조직위에서는 원도급업체인 B 업체에 대금 90%를 지급했으나 B 업체는 "줄 돈이 없다"며 하도급업체들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올림픽 기간 전국의 컨테이너 판매·임대 업체들이 평창과 강릉에 납품한 컨테이너만 4천여 동.
업체당 적게는 30∼40동, 많게는 100동 넘게 납품했다.
컨테이너는 대회 운영인력의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으로 폭넓게 사용됐다.
하지만 컨테이너를 빌려준 업체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업체도 있다.
심지어 빌려준 컨테이너들이 누군가에 의해 팔아넘겨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돈도 못 받고 컨테이너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피해 업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조직위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조직위는 하도급업체와는 계약관계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업무만 부담할 뿐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불할 의무도,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 업체 대표들은 "공공기관에 가까운 조직위가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을 묵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평일이면 평창까지 먼 거리를 달려와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직위와 원도급업체가 책임을 떠미는 사이 영세업체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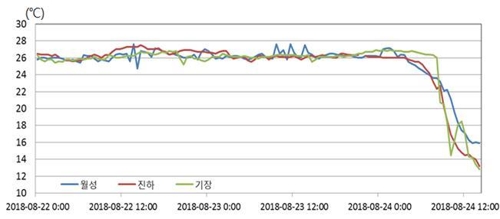
![[기업 포커스] '신차장 다이렉트', 최대 312만원 할인](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AA.1759482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