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칼럼] '시선(視線)의 높이'가 문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존의 상식=무식'으로 만드는
기술 발전의 태풍 불어오는데
굴뚝시대 안목의 정책들 난무
지도자 눈높이가 국가의 눈높이
'권토중래' 미래부 신설 핀란드처럼
최고의 국가비전 제시해야"
이학영 논설실장
기술 발전의 태풍 불어오는데
굴뚝시대 안목의 정책들 난무
지도자 눈높이가 국가의 눈높이
'권토중래' 미래부 신설 핀란드처럼
최고의 국가비전 제시해야"
이학영 논설실장
![[이학영 칼럼] '시선(視線)의 높이'가 문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07.14213011.1.jpg)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서 손을 떼고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그가 “일자리를 없애는 로봇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일자리 보고서가 나온 직후였다. WEF 보고서는 “로봇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 전 세계적으로 임금과 생활수준 등의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게이츠는 이런 전망을 근거로 로봇세 도입론에 힘을 보탠 건데, 여러모로 성급했다. 미국 재무장관과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당신이 한 일을 돌아보라”며 게이츠를 핀잔했다.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인 윈도를 개발해 전 세계에 ‘사무자동화 혁명’을 일으킨 그가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1985년 처음 등장한 윈도가 각 사업장에 확산되면서 단순 사무보조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신 더 고급스러운 일자리가 속속 개발됐다. 윈도 출현 당시 미국 내 일자리는 9100만 개였지만, 이후 신규 일자리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를 앞지르며 5300만 개가 순증(純增)했다. 윈도가 등장했던 당시 ‘일자리 파괴’를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세(稅)’를 도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게이츠는 자기가 세운 업적의 의미에 무지(無知)함을 스스로 폭로한 꼴이 되고 말았다.
며칠 전 WEF가 그동안의 주장이 ‘오진(誤診)’이었음을 고백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게이츠의 로봇세 주장은 더욱 우스개가 돼 가고 있다. “향후 10년간 로봇기술 발전으로 세계에서 창출될 일자리가 1억3300만 개에 달하는 반면, 로봇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는 7500만 개에 그칠 것”이라고 수정 전망한 것이다.
전 세계에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킨 선구적 기업가였던 게이츠와 세계 최고 지식기관을 자임하는 WEF가 범한 실수에는 공통점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해 더 큰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로봇 외에 인공지능(AI)도 인간의 두뇌작업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줄을 이었지만, 이 역시 실상은 정반대다.
구글은 AI 도입에 따른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1만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고, 페이스북도 4500명인 관리자 수를 75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경영컨설팅회사 맥킨지는 “AI가 세계 경제에 2030년까지 13조달러의 추가 가치를 더하고, 연간 세계 총 GDP를 1.2%씩 증가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전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직업군은 현재의 총 고용 대비 43%에서 2030년 32%로 떨어지는 반면, 디지털 직업군은 현재 42%에서 53%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다.
이렇게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대전환해 나가고 있다. ‘천재 기업가’ 소리를 들었던 사람조차 순식간에 바보 소리를 듣는 시대다. 우리나라를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세상 보는 눈을 의심케 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고작 생각해 내는 게 세금으로 만들어 내는 공무원과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따위다. 한국인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의료 바이오 IT 등의 산업에는 ‘재벌특혜 불가’ 같은 케케묵은 논리로 채운 족쇄를 풀지 않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 크게 뜨고 보려 하지 않으니 안목이 높아질 리 없다. 굴뚝시대 눈높이로 온갖 정책을 재단(裁斷)하니 곳곳에서 한숨과 비명을 넘어 체념과 좌절이 똬리를 틀어간다.
격변기에 들어선 세계를 최대한의 눈높이로 조망하면서 기회를 포착해 내고, 예상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노키아 몰락 이후 홍역을 치른 핀란드는 행정부 내에 ‘미래부’를 설치해 치밀하게 미래전략을 짜고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시선(視線)의 위기’가 심각하다.
hak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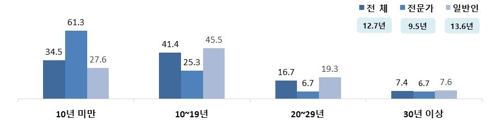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