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칼럼] 규제차익이 경제를 가름하는 시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 5위 고소득 국가 된 아일랜드처럼
규제 풀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 제공
인력과 자본 끌어들이는 생태계 조성해야
정갑영 <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前 총장 >
규제 풀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 제공
인력과 자본 끌어들이는 생태계 조성해야
정갑영 <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前 총장 >
![[정갑영 칼럼] 규제차익이 경제를 가름하는 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07.14213014.1.jpg)
젊은 인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해외에서 고급 두뇌를 유치하기 힘든 한국의 상황이 상서롭지 않아 보인다. 대학과 기업이 최고 전문가를 해외에서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은가. 보수는 물론 주택, 자녀 교육 등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한국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인력뿐만이 아니다. 자본과 기술도 사이버 공간을 타고 수시로 이동한다. 세계 각국이 세금 감면과 규제 철폐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외에서 투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정책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나라가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4000달러를 넘어 세계 175개국 중 다섯 번째 고소득 국가가 됐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7년 동안 선진국 역사상 가장 높은 연평균 5.6%의 성장을 달성해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네 배 증가했다. 12년째 3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1980년 이후 아일랜드에 쌓인 해외 직접투자만도 무려 8800억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20대 기업 중 14개가 외국 기업이고, 법인세의 80%와 비농업 분야 고용의 57%도 해외 자본 몫이다. 12.5%의 낮은 법인세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의생명, 금융산업 등 최첨단 산업을 가장 많이 유치했다. 한때 감자 흉작으로 인구의 25%가 감소했던 대기근(大饑饉)의 역사를 가진 작은 나라가 자원과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아일랜드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 예외로 하더라도 싱가포르와 아이슬란드 등 많은 나라가 유사한 전략으로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굳이 공통적인 경쟁력의 원천을 찾자면 개방적인 투자 유치라고 할 수 있다. 규제를 풀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매개로 자본과 기술, 전문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이른바 국가 간 규제의 상대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아마존이 시애틀에 이어 제2 본사 설립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 전역에서 238개 도시가 파격적인 제안으로 유치 경쟁을 벌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마존은 국제공항에서 45분 이내의 접근성과 인구 100만 명, 고학력 인력 풀 등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뉴저지의 뉴어크(Newark)시는 무려 70억달러의 세금 감면까지 추가하기도 했다.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완화 경쟁을 벌이는 지역도 수두룩하다. 모두 규제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국제적인 조세회피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규제차익을 추구하는 전략 아니겠는가.
지금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거나 고용을 확대해서 성장을 이룩하는 시대가 아니다. 21세기 패러다임은 국내외 인력과 자본이 규제차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해외는 물론 국내 자원도 모국을 외면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 문제도 결국은 이런 패러다임으로 풀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은 가능하지만, 성장 없는 고용 창출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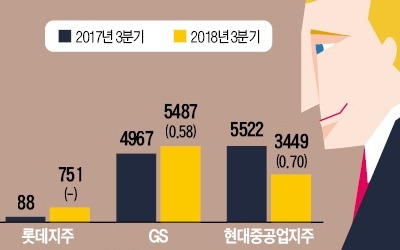
![[정갑영 칼럼] 시애틀의 '작은 도시, 큰 기업' 신화](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07.14213014.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