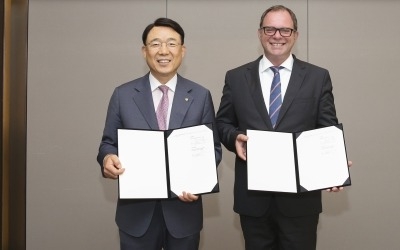마이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약하는 K마이스
마이스 이슈
기고 - 신현대 엑스포럼 대표
국제 전시장 등 인프라 부족하고
업계 출혈경쟁으로 생태계 미성숙
전시산업 경쟁력 키울 정부 지원 절실
마이스 이슈
기고 - 신현대 엑스포럼 대표
국제 전시장 등 인프라 부족하고
업계 출혈경쟁으로 생태계 미성숙
전시산업 경쟁력 키울 정부 지원 절실

그렇다면 국내 전시산업은 어떤가. 정부의 이번 신규 전시회 개최의 배경엔 역설적으로 국내 전시산업의 열악한 경쟁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그동안 전시산업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의 한 축으로서 수많은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민간 주최자의 노력과 투자가 더해지면서 몇몇 전시회는 세계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즐비하다. 세계 각국의 기업과 바이어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기엔 아직 인프라도 부족할뿐더러 건전하고 효율적인 산업 생태계도 조성돼 있지 않다.
전시산업에 있어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중국만 보더라도 한국의 열악한 현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2020년 세계 최고 전시산업 국가라는 ‘전람굴기’를 목표로 세운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국내보다 무려 4~5배 이상 큰 규모의 전시장을 여럿 갖춘 중국은 CES(세계 최대 전자쇼),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와 같은 글로벌 행사의 아시아 개최를 싹쓸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만한 시설은 코엑스와 킨텍스, 벡스코가 전부다. 잠실의 국제교류복합지구, 현대차그룹의 GBC 신축도 말만 무성할 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 컨벤션센터는 고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역시 이전보다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사·중복 전시회가 난립하면서 제살깎아먹기식의 과당·출혈 경쟁만 심화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을 비롯해 전시장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이 오르면서 전시업계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홍보하고 기업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할인과 무료 행사,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시장의 룰을 깨뜨리고 심지어 민간 전시 주최자와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내에서 뉴욕 팬시푸드쇼와 같은 대형 행사가 열리면 좋겠다는 정 부회장의 조언이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해 온 전시업계의 노력을 무시한 채 신규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업계의 현실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면서 열렸다 종적을 감춘 단발성 행사들을 숱하게 보지 않았던가. 정부는 국내 전시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업계와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국제적인 전시회를 만드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추로 접어드는 수확의 계절에 무겁게 디뎌지는 발걸음이 일엽지추(一葉知秋)의 기우가 아니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