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 서울 관훈동 노화랑에서 개막하는 주 화백의 개인전은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 특유의 맛이 살아 있는 극사실주의 화풍을 파고든 작가의 고집과 역량, 예술을 조명하는 자리다. 내년 2월 홍익대 정년퇴임을 앞두고 초심을 돌아보는 의도도 깔려 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30여 점의 작품은 1970년대 이후 극사실의 좌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기계가 재현할 수 없는 감성적 느낌으로 나무와 숲을 그린 근작들이다.
작가는 “이번 신작들은 숲과 나무의 전경을 사실과 추상의 이중구조로 분할해 현실과 환상, 물질과 정신을 대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풍경화라는 회화적 형식에 사람들이 은근히 욕망하는 세상과 어두운 현실을 결합해 표현하는 식이다. 사진의 ‘아웃 포커스’ 기법을 활용, 상단과 하단이 잘린 나무를 클로즈업해 세밀하게 묘사하는 반면 배경인 숲은 과감하게 무시했다. 인공조명처럼 느껴지는 빛의 개념을 통해 그림자로 두드러진 허상을 더 실제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동안 극사실적으로 나무를 그리고 피스 작업(기계에 물감을 넣고 스프레이 식으로 뿌리는 작업)으로 그림자를 표현했지만 요즘엔 실상과 허상의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붓 작업도 병행한다.
“부분적으로는 사진보다 더 사실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연의 이상화된 모습을 추구한 겁니다. 화면 전체를 모노크롬으로 표현하면서 굵은 나무 기둥은 극사실로, 나뭇잎과 그림자는 상상으로 꾸며 상상과 내면의 세계를 조화시켰죠.” 그의 그림을 인간의 시각과 지각으로 받아들인 내면의 풍경화라고 부른 까닭이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그의 최근 화면이 더욱 가볍고 경쾌해진 건 그만큼 내면의 자족과 기쁨을 찾았다는 표현일까. 작가는 “자연은 묘사할수록 멀어지고 다가갈수록 아득해진다”며 “그러나 자연과 교감하며 서정시인의 노래처럼 살아 숨쉬는 자연을 그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초록과 청색으로 압축한 새벽 숲과 나무의 청신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은 형태의 입체감과 볼륨 없는 그림자, 간결한 붓 터치를 특징으로 한다. 쭉쭉 뻗은 나무 사이로 자리잡은 풍경에는 자연의 영혼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눈으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손으로 자연의 이미지를 보는 것 같은 감각의 확장이자 자연 본연의 상태와 조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이달 30일까지.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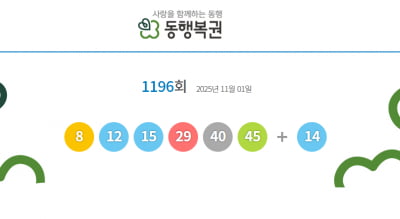
![[내일 날씨] 낮부터 추워져…강한 바람에 체감온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ZN.4222057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