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④ 31년만의 선거제 개혁…타협적 다당제 제도화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일제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심을 왜곡 없이 반영하는 근본적인 수준의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도입돼 우리 정치권에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다당제'가 제도화되는 계기로 이어질지 시선을 끈다.
![[선거제 개혁] ④ 31년만의 선거제 개혁…타협적 다당제 제도화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PCM20181005000110990_P2.jpg)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의 큰 틀이 갖춰진 것은 1988년 치러진 제13대 총선을 앞두고서다.
직전의 1985년 제12대 총선까지는 1개 선거구에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다.
그러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실인 '87년 체제'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선거제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현행 제도가 큰 틀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지속돼 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선거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면 '87년 체제' 이후 31년 만의 선거제 개혁이 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1987년 이후에도 선거제 개편은 있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04년 제17대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각각 따로 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을 손질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근본적인 수준의 선거제 개혁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후 매번 총선 때마다 총 의석수 300석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금씩 조정했던 것 역시 선거제 개혁이라 부를 일은 아니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대표성과 비례성의 강화가 선거제 개혁 논의의 핵심 키워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방향대로 선거제 손질이 이뤄지면 현재의 다당제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의 20대 국회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러 개의 중소정당이 존재하는 다당제 구도로, 원내 제1정당도 과반 의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협치'가 화두일 수밖에 없었다.
여당으로서는 입법 등을 위해 다른 정당과 손잡고 연대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총 5개의 정당이 사안별로 연대하는 '협치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당제보다는 '거대 양당' 체제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현 선거제가 지속된다면 당장 내후년 총선을 거치며 다당제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타협적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런 점에서다.
통상 다당제는 현행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중심제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분석이 이어져 왔다.
이들은 다당제가 대통령제의 효과적인 면을 상쇄하며 서로 양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다당제가 왜 안 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외에는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함께하는 나라가 없고, 어느 나라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정당정치는 다당제라는 점에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타협적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진다면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포가 그대로 의회 의석수로 반영돼 갈등을 제도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도입돼 우리 정치권에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다당제'가 제도화되는 계기로 이어질지 시선을 끈다.
![[선거제 개혁] ④ 31년만의 선거제 개혁…타협적 다당제 제도화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PCM20181005000110990_P2.jpg)
직전의 1985년 제12대 총선까지는 1개 선거구에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다.
그러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실인 '87년 체제'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선거제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현행 제도가 큰 틀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지속돼 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선거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면 '87년 체제' 이후 31년 만의 선거제 개혁이 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1987년 이후에도 선거제 개편은 있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04년 제17대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각각 따로 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을 손질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근본적인 수준의 선거제 개혁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후 매번 총선 때마다 총 의석수 300석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금씩 조정했던 것 역시 선거제 개혁이라 부를 일은 아니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대표성과 비례성의 강화가 선거제 개혁 논의의 핵심 키워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방향대로 선거제 손질이 이뤄지면 현재의 다당제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의 20대 국회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러 개의 중소정당이 존재하는 다당제 구도로, 원내 제1정당도 과반 의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협치'가 화두일 수밖에 없었다.
여당으로서는 입법 등을 위해 다른 정당과 손잡고 연대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총 5개의 정당이 사안별로 연대하는 '협치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당제보다는 '거대 양당' 체제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현 선거제가 지속된다면 당장 내후년 총선을 거치며 다당제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타협적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런 점에서다.
통상 다당제는 현행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중심제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분석이 이어져 왔다.
이들은 다당제가 대통령제의 효과적인 면을 상쇄하며 서로 양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다당제가 왜 안 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외에는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함께하는 나라가 없고, 어느 나라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정당정치는 다당제라는 점에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타협적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진다면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포가 그대로 의회 의석수로 반영돼 갈등을 제도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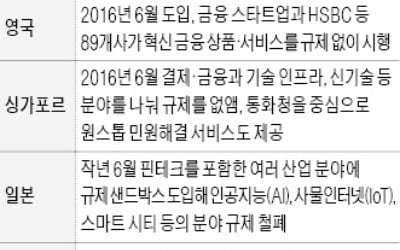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