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일본 인공지능(AI) 기업과 연구개발 계약을 맺기 위해 도쿄를 방문한 게임업체 고위 임원을 만났다. 국내에서 AI 전문인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일본까지 건너온 참이었다.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AI 전문가를 확보할 것이냐고 물었다.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그는 “시간 날 때마다 KAIST 등 국내 유명 공대를 방문해 게임산업에 대한 교수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보겠다”고 했다. 아직까지 한국 대학교수들은 제자들이 학계에 진출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게임회사에 취직하면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공대판 ‘사농공상(士農工商)’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지적인 셈이었다.
'직업 귀천' 따지는 한국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게임 분야에서도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적지 않다. 게임에 사용되는 각종 아이템이 당초 구상했던 것처럼 실제로 기능할지, 아이템 간 ‘힘의 균형’을 이룰지 등을 AI가 24시간 쉬지 않고 초고속으로 게임을 미리 해보며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수천 시간에 걸쳐 게임을 해봐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을 AI는 짧은 시간에 알 수 있다. 그만큼 게임 개발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업계 수요가 적지 않고 대우도 상당하지만 충분한 인력을 국내에선 확보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것도 ‘점잖고 품위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 제자들을 보낼 수 없다는 학계의 구시대적 인식 탓에 외국에 손을 벌려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치열한 AI 전문가 양성 및 확보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앞세운 미국은 관련 분야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를 무기로 삼은 중국도 결코 뒤질 수 없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AI가 만드는 좋은 일자리 기준
일본 역시 AI가 뜨거운 이슈가 된 지 오래다. 민·관·학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AI 보급과 관련해 새로운 규칙 마련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AI 제조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AI 활용 7대 원칙’을 제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사이타마공대 등 일본 주요 대학엔 AI 전공학과가 개설됐고 AI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실증실험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지난달엔 도쿄 신주쿠역에서 응급환자나 수상한 사람을 찾아내는 보안 로봇의 실증실험이 진행됐다.
대학도 학생도 기업도 AI가 활용되는 분야라면 한국처럼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일본의 인재채용기업 디스코가 내년 대학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 선호도 조사에선 게임소프트웨어 회사가 의료 분야 전문기업, 컨설팅회사, 은행과 함께 최상위권 취직 희망 기업에 포함됐다.
AI가 기존 직업을 대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바꾸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AI 시대에 남들은 멀찍이 앞서 뛰고 있는데 한국만 시대착오적 명분론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kimdw@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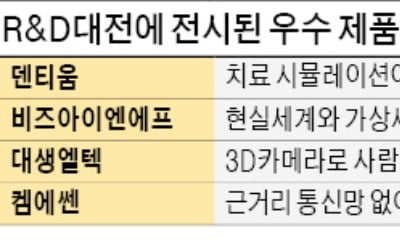
![[한경 광고 이야기] (6) USP 전략 광고 눈길](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AB.1840567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