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ETRI 본부장
개인정보 활용 막는 규제 풀어야, 구글·페북 등과 경쟁할 수 있어

박 본부장은 AI 개발 경쟁은 곧 플랫폼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사용자들의 ‘빅데이터’가 AI 개발의 원료가 되므로 사용자를 잡아둘 플랫폼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서비스 플랫폼에서 모은 빅데이터로 AI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유한 데이터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명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마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알리고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에서야 가명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 기업들이 AI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각개격파’ 전략을 택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AI의 핵심 기술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확보하자는 얘기다. 현재 ETRI는 엑소브레인을 음성·영상·문맥 인식 등에 특화해 개발하고 있다. 한컴의 번역 서비스 ‘지니톡’, 국회도서관의 ‘지능형 입법지원’ 서비스가 엑소브레인 기술이 활용된 사례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업체들의 기술력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핵심 기술부터 먼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기술에 ‘거품’이 꼈다는 지적도 했다. 실제 기술 수준보다 대중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다. 박 본부장은 “현재 AI의 지능 수준은 꿀벌 수준에 불과하다”며 “AI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내려오면 시장도 더 성숙된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좌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장은 “국내 AI 개발자들은 수백 명에 불과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단위 자체가 다르다”며 “데이터도 부족한 한국은 하나씩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게 유일한 전략”이라고 했다. 서정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활용 자체를 막고 있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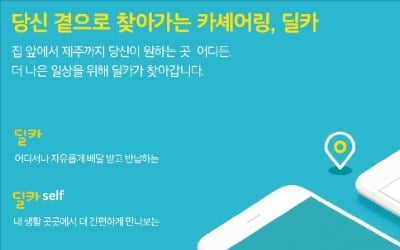

![[책마을] 뿌리 깊은 관료주의 천적은 AI 장착한 로봇공무원](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AA.1847942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