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의 전자수첩] 눈치보는 화웨이·사라진 샤오미…중국 덜어낸 CES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CES 참가 中기업 20% 감소
무역전쟁, 경제적 불확실성이 원인
전략 수정 나선 화웨이, 불참한 샤오미
무역전쟁, 경제적 불확실성이 원인
전략 수정 나선 화웨이, 불참한 샤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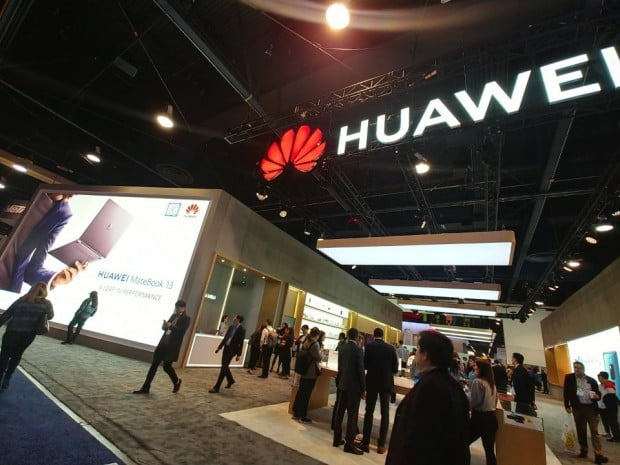
거세진 미중 통상분쟁의 파고는 세계 최대 전자 축제 'CES 2019'까지 번지며 중국의 뜨거웠던 기술 굴기를 식혔다. 미국과 중국은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수입제품에 수십억달러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또 최근 화웨이 부회장 겸 CFO인 멍완저우 체포 사건은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중국은 미국 시장을 앞두고 신중하고 절제된 모습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CES 개막일인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에서 확인됐다. 우선 참가업체 수가 현저히 줄었다. 실제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통계에 따르면 올해 CES에 참여한 중국 업체의 수는 지난 4일 기준 1211개다. 지난해 1551개 업체가 참석했던 것보다 20% 이상 줄었다. 참가업체 수로 중국의 현주소가 읽히는 건 그간 CES가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표본이 돼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1년 4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한 이래 7년간 꾸준히 참가업체를 늘리며 기술 성장을 과시해왔다. 2018년에는 무려 4배에 달하는 업체가 참가하며 전 세계 전자·I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CES 2018은 중국 가전쇼”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이번 CES 기조연설 예정자 명단에 중국 최고경영자(CEO)가 빠진 점도 중국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위청둥(餘承東·리처드 유)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그룹 CEO가 2년 연속 기조연설 무대에 올랐던 것과 대비된다.
이번 행사엔 중국의 중소 업체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불참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다. 이들은 무역전쟁으로 미국에 판매하는 자사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주요 시장을 자국으로 결론내면서 미국을 우선순위에서 뺐다.
![[이진욱의 전자수첩] 눈치보는 화웨이·사라진 샤오미…중국 덜어낸 CES](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01.18651590.1.jpg)
샤오미는 아예 이번 CES를 건너뛰었다. 민감한 시기에 애써 무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업체 바이두는 지난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내세우며 의욕을 불태웠지만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대규모 야외 부스를 세웠었지만, 이번엔 소규모 부스를 꾸렸다.
화웨이 부스에서 만난 조이 PR 매니저는 "미국과의 마찰로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이거나 불참한 건 맞다"며 "화웨이 역시 행사 비용을 줄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 TV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참여하던 업체들이 불참한다는 사실에 끝까지 고민, 또 고민했다”며 “CES 대신 다른 무역 행사에 참여하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미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냈다.
다만 이번 CES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에 비해 참가업체 수는 줄었어도 여전히 3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몇년 간 보여준 폭발적 굴기가 한풀 꺾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라스베이거스(미국)=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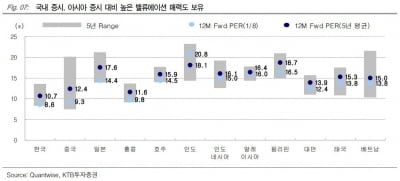
![[CES 2019]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애플과 협력 당연…소비자 위해 누구와도 가능"(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01.1863914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