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의 R까기] 외우기도 벅찬 '아파트 브랜드'가 뭐길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형부터 중소형까지 아파트 브랜드 리뉴얼 박차
"브랜드 보다는 가치 채우는 게 우선"
"브랜드 보다는 가치 채우는 게 우선"

아파트를 주로 짓는 주택전문 건설사들의 하소연은 한결같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비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입찰의향서를 낼 기회도 드문 편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주시 조합들이 직접 뽑는 직접투표지만, 후보군으로 등록조차 안되는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건설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아파트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에 땅을 사거나 땅을 가지고 있는 시행사를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시간은 '분양'이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있긴 하지만, 분양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는데다 아파트 지을 땅도 줄어들고 있으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기에 늘상 고민하는 부분이 '브랜드'다. 건설사 알리기는 둘째치고 브랜드라도 알리자는 것이다.
최근 2년 사이에 건설사들이 새로 선보인 브랜드만해도 제법 된다. 쌍용건설이 지난해 주택 브랜드를 통합해 '더 플래티넘(The Platinum)'을 선보였고 앞서 신세계건설은 '빌리브’(VILLIV)' 브랜드를 선보였다. 사업을 확대하면서 새 브랜드를 내놓기도 했다. 태영건설은 기업형 임대 아파트 브랜드도 '데시앙 네스트(DESIAN NEST)'를 론칭하고, 대보건설은 오피스텔 브랜드도 '하우스디 어반(hausD urban)'을 내놨다.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애착은 1군 건설사는 물론 공공 아파트도 예외가 없다.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3.0'이라는 디자인 모델을 선보였고 대우건설은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푸르지오'를 내놓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이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다. 이번에 새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서 LH는 15년동안 다섯 번째의 브랜드가 나오게 된다. 2004년에 '주공그린빌'을 시작으로 '뜨란채','휴먼시아', '천년나무' 등이 줄줄이 나왔다. 중간에 LH만 달아서 'LH아파트'로 지난 시간도 있으니 엄밀히는 6번째인 셈이다.

한 브랜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브랜드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는 브랜드들은 리뉴얼이나 브랜드를 바꾼다고 하면 제품 내용물부터 패키징, 물류디자인, 모델이미지 등까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충성고객의 이탈을 고민하기 때문에 비용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건설사들은 비교적 쉽게 브랜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는 충성고객이 적고 브랜드 변경에 따른 비용증가가 적기 때문으로 봤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는 데 비용은 많아봤자 1억원 정도밖에 안든다"고 귀띔했다. 광고대행사나 브랜드 업체를 통해서 받은 콘셉트 중 선정만 하면 되는 방식이어서다. 새로 지을 아파트에 도입되니 당장 비용을 들여 바꿀 것도 없다. 홍보물에 들어갈 인쇄 디자인 정도만 변경하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파트는 라면이나 과자같이 자주 살 수는 없는 재화다.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이라는 특징도 있다. 하지만 더 큰 특징은 건설업계가 여전히 '수주'만 중시하는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시행사나 조합의 첫 선택, 이른바 수주만 하면 성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렇다보니 '일단 브랜드를 내세워 수주하자'며 아파트 브랜드에 목을 메는 결과로 이어진 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 시공을 하면서도 하자보수와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브랜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쉽사리 얼굴만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한 강남의 아파트에서 시공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견은 팽배하고 법적인 다툼도 남아 있지만, 요약을 해보면 조합측에서는 '시공사에 기대를 했지만 그만큼 이름값 못한다'는 의견이었다. 건설사들은 '브랜드'를 들이대지만 정작 콧대높은 강남 아파트들이 이제는 조합이 중심이 되서 '브랜드'를 빼기를 원한다. 건설사들은 브랜드를 내세워 명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내 명품 아파트들은 건설사 보다는 자체 브랜드를 원하는 게 현실이다. 진정한 명품은 브랜드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브랜드에 걸맞는 가치가 브랜드를 성장시킨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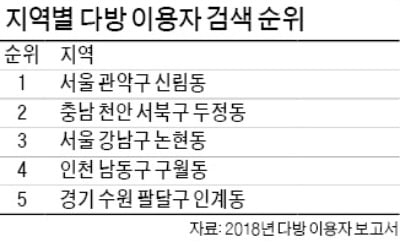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