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턴 크리스텐슨 '번영의 역설'
1970년대 한국 1인당 GDP 300弗…50여년 흐른 뒤엔 번영의 길 걸어
수십억弗 교육·인프라 원조 받고도 가난 내몰린 과테말라·부룬디와 달라
기업 주도의 성장·혁신이 운명 판가름…新시장 개척이 곧 경제발전의 뿌리

지금 크리스텐슨은 한국을 찾으면서 50년 전 한국과 어떤 유사점도 찾지 못한다. 한국은 이제 다른 국가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그는 여기서 학자로서 의문을 품는다.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겪은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기 힘들다. 수십 년간 가난한 국가들을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과 국제기구들은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보건과 환경을 개선시켰다. 하지만 수십억달러의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당시 국민소득이 한국과 비슷하던 부룬디와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등은 아직 소득이 그대로다. 어떤 국가는 번영으로 향하고,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은 왜 가난으로 내몰리는지 크리스텐슨은 수십 년간 탐구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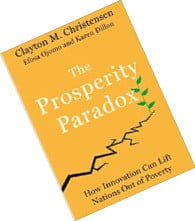
이런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크리스텐슨은 톱다운 방식인 일반 경제개발 모델의 한계를 확인하고, 기업 주도의 경제성장과 시장을 창조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가의 야망에 바탕을 둔 혁신을 통해 국가 사회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을 이끌어낼 때 경제 발전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 시장을 창조하는 ‘혁신의 힘’을 강조한다. 다른 혁신들도 이익과 일자리는 만들지만 시장을 창조하는 혁신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시장 창조 혁신은 복잡하고 값비싼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스텐슨은 일반인이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비소비자(non-consumer)를 소비자로 전환시키는 시장 개발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같은 시장 창조 혁신은 경제 엔진에 불을 붙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이익을 올리며 사회 문화를 변화시킨다. 시장은 결국 사회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요인들을 사회로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창출하는 과정에서 국가 건설도 우연히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시장 창조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혁신에서 사용하는 푸시(push)전략보다 수요를 견인하는 전략이다. 그는 나이지리아의 국수공장 하나가 나이지리아의 사회 문화를 바꾼 사례를 들었다. 싱가포르 기업 톨라람은 나이지리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수에 착안했다. 국수공장을 건설하고 판매망을 구축했다. 전문적인 교육도 하고 전기도 들여왔다. 상하수도 시설도 지었다. 이 기업이 투자한 건 나이지리아의 국수 시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기업이 나이지리아 정부의 지원을 바랐다면 아직 아무것도 못 했을 것이다.
크리스텐슨은 또 법 제정 문제도 지적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봤자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어서 그 나라 문화와 사정에 맞지 않는다. 법을 잘 만들려고만 하는 건 번영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패도 문제로 보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메시지는 간결하다. 기업의 수익이야말로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적인 기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시장을 찾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계는 기회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책마을] 중국·일본이 비호감 국가? 제대로 알면 '보물단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2/AA.18872009.3.jpg)
![[책마을] 새벽 5시 기상, 이 한 가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2/AA.18872013.3.jpg)
![[책마을] "혁신은 마법 아닌 작은 변화"…무인양품 되살린 기본 지키기](https://img.hankyung.com/photo/201902/AA.1887201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