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측이 이 공매 자체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낙찰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연희동 자택 낙찰자는 낙찰가격의 10%인 5억1천만원을 이미 보증금으로 캠코에 냈다.
캠코는 "낙찰자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캠코는 오는 25일 이 물건 매각허가결정을 할 예정이다.
잔금 납부 기한은 매각허가결정 30일 뒤인 다음 달 24일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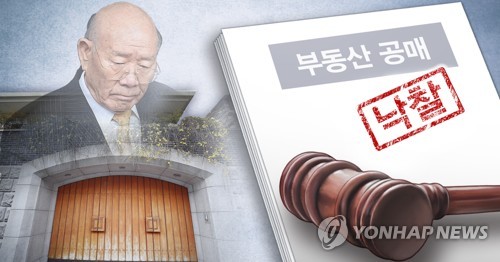
적지 않은 보증금이 이미 들어간 상태인 만큼 이 물건을 사들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매각이 취소되지 않는다.
전씨의 추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희동 자택은 낙찰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씨 자택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내고 공매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매매, 임대 등 소유주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캠코 공매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전씨가 집을 내주지 않는다고 버틸 수 있다.
이때는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이 걸린다.
명도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캠코가 이 물건 감정가를 책정할 때도 내부에 들어가지 못해 기록 등으로 대신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전씨 측 관계자가 낙찰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전씨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공매 자체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고 그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측근이 낙찰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