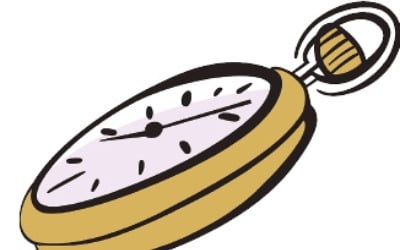시행 9개월…계도기간 종료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계도) 기간도 이달 말로 끝난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삶이 나아졌다는 직장인과 경영자는 드물다. 직장인들은 월급이 줄고, 경영자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끊임없이 “일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법’이라는 하소연이다.

생산직 근로자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조두순’(전자발찌를 착용한 특정 범죄자)이 밤거리를 배회해도 출동할 수가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청원했다.
기업인들도 힘겨워한다.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나갈 궁리를 하는 기업인이 많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 중소 가구업체 대표는 “차라리 회사를 팔아 자식들에게 주고 때려치우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타격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훨씬 크다”며 “30년 경영한 현장의 경영인들이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면 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회사에서 일을 배워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됐으니 퇴근하라고 해야 하는 현실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
중견기업인 동관제조업체 A사 대표는 지난 9개월이 악몽 같았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앞서 직원 116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기존 인력으로는 납기일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이 기간 직원 113명이 그만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와 퇴직금이 25%가량 줄어들자 직원들이 야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빠져나갔다.
동파이프를 생산해 70%를 수출하는 A사는 결국 이번주 인력에 맞춰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내린 결단이다. 이 회사 임원은 “가뜩이나 중국과 베트남 경쟁사의 저가 공세로 어려운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출 경쟁력이 더 떨어졌다”며 “이러다가 회사가 문을 닫게 될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A사뿐만이 아니다.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수익성 악화, 경쟁력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중견 해외플랜트 건설사인 B사는 주 52시간 근로제 탓에 공사를 제때 못 마쳐 손해배상금을 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한국 근로자 1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B사 임원은 “공사원가가 20~30% 올라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발주처에 공사 이행보증책임 등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중견 자동화설비 제조업체인 C사의 한 임원은 야근을 하다가 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을 발견하고 찾아갔다. 20대 연구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다. 임원은 “빨리 퇴근하라”고 다그쳤다. 직원은 “이것만 하고 가면 안되나요.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며 울먹였다. 임원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연구개발 직원들이 주 52시간제 탓에 성장할 기회를 빼앗겼다. 직원 개인의 경쟁력은 물론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힘겨운 근로자들
갑자기 수입이 줄어든 근로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고충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향하는 곳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다. 청원 내용의 대부분은 줄어든 급여와 늘어가는 빚, 더 쪼들린 삶에 대한 하소연이다. ‘삶의 질 향상’이란 제도 시행 취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한 생산직 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탓에 평균 300만원 이상이었던 월수입이 200만원대로 줄어 매달 적자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날마다 돈 걱정”이라며 “서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생산직 근로자도 “줄어든 월급을 충당하느라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중견기업 직원은 “일의 양과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단축해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있다. 6000명의 직원이 250시간씩 하던 일을 직원을 뽑지 않은 채 갑자기 160시간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불합리한 지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전설리/김낙훈/김진수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