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갈등은 경제와 민간 교류, 국제 외교 무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50주년 한·일 경제인회의가 돌연 연기되면서 기업 간 관계도 경색되고 있다. 양국 기업인들은 경제 단절로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갈등 기류에 휩쓸려 발을 구르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학자들은 양국의 오랜 문화·역사관 차이를 이해하면 해법이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명분을 중시하는 주자학적 사고, 일본은 실리를 중시하는 양명학적 사고에 익숙해 있으므로 과거 문제 해결도 이 같은 근본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과 한국에서 두루 교수를 지낸 김용운 전 한양대 대학원장은 한·일 갈등의 뿌리를 민족의 집단 무의식인 ‘원형 사관’으로 설명한다. 그는 《풍수화》라는 책에서 “대의를 앞세우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승자가 곧 정의’라는 식으로 생존을 중시한다”며 “한국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집착하는 반면 일본은 과거를 흘러간 역사로 인식하는데 이런 차이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고 말한다.
문제는 양국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다. 양국 집권층이 ‘반일’이나 ‘혐한’을 자극하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포퓰리즘으로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 현안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양쪽 국민이 잃는 게 더 많다. 전략적 제휴의 실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옳다.
다행히 양국 인적 교류는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었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753만 명, 한국을 찾은 일본인이 300만 명이다. 도쿄에서 기모노 차림으로 문화체험을 즐기는 외국인 5명 중 1명이 한국 젊은이다. 경복궁 주변을 한복차림으로 관광하는 일본 젊은이도 많아졌다.
‘망언’으로 한국인의 공분을 샀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001년 도쿄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 취객을 구하다 숨진 의인 이수현 씨의 부친이 최근 별세하자 “일본 국민을 대표해 조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가면 오랜 앙숙 관계에도 머잖아 봄이 오지 않을까 싶다. 갈등을 푸는 열쇠는 역시 따뜻한 감성과 상호 이해, 존중과 교감 속에 숨겨져 있다.
kd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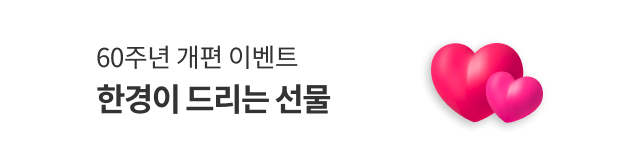

![[천자 칼럼] 100명 넘은 'LG 의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274236.3.jpg)
![[천자 칼럼] 기업가의 촌철살인 어록](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26361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