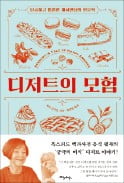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디저트(후식) 가게로 향할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식사 메뉴만큼 디저트 메뉴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됐다. 디저트는 식욕 중의 식욕이라고 불리는 ‘달콤함’으로 무장해 식후 포만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또다시 유혹한다.
아이스크림부터 사탕, 초콜릿, 케이크, 과일, 푸딩, 마카롱까지 디저트가 넘쳐나는 시대다. 최근 몇 년 사이 디저트 전문 가게가 눈에 띄게 늘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유명 디저트 매장을 경쟁력으로 늘리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디저트 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GS25에 따르면 자사 점포에서 판매하는 디저트빵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1.6배 늘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늘어났다.
음식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써온 프리랜서 작가 제리 퀸지오는 《디저트의 모험》에서 일상에 깊게 파고든 디저트의 유래와 기원을 파고든다. 달콤한 음식과 짭짤한 음식이 한데 상에 올랐던 때부터 디저트가 부흥을 맞으며 분자요리사가 등장한 지금까지 디저트의 역사를 아우른다. 중세 왕과 소수 계층만 즐기는 최상위 디저트부터 최근의 가장 대중적인 디저트도 등장한다. 중세 사람들은 왜 파이 안에 살아있는 검은 새를 넣어 즐겼는지, 19세기 최고의 파티시에가 되기 위해선 왜 건축학을 공부해야 했는지,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미국에서 애국심의 상징이 됐는지 등 디저트에 숨겨진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려준다.
저자는 “모든 디저트가 다 화려하고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내가 즐기는 디저트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한 스쿠프처럼 소박할 때도 있고 버터를 넣은 레몬타르트처럼 넉넉할 때도 있다”며 “꼭 세련될 필요는 없으며 그냥 디저트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책을 읽으며 디저트가 어떤 것인지보다는 그저 디저트가 주는 기쁨과 사랑스런 추억에 마음을 열게 된다. (제리 퀸지오 지음, 박설영 옮김, 프시케의숲, 316쪽, 1만6800원)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책꽂이] 스타트업 히어로 등](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AA.19221399.3.jpg)
![[저자와 함께 책 속으로] "내 목소리 줄여 타인의 노래 듣는 것…합창과 사회생활 닮은 점이죠"](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AA.1933588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