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中 위기론'
2세대가 잠재울까
미샤 등 1세대는 속속 철수

K뷰티 위기론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를 찾았다. 유동인구가 많은 난징둥루에 있는 편집숍 세포라로 가 직원에게 “K뷰티 존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는 “인기가 별로 없어 몇 달 전 K뷰티존을 없앴다”고 답했다.

중저가는 中에, 럭셔리는 日에…'낀 K뷰티' 선수교체로 승부
지난달 28일 중국 상하이 번화가 난징둥루. 이 번화가 입구 사거리에 있는 3층 규모 이니스프리 매장은 한산했다. 손님은 층마다 두세 명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간. 50~100m 떨어진 세포라, 왓슨스 등 헬스앤드뷰티(H&B) 스토어는 20~30대 여성들로 북적였다. 슈에무라 랑콤 등 글로벌 브랜드 부스엔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다. 세포라 등에 10여 개 있던 한국 브랜드는 2개밖에 볼 수 없었다. ‘K뷰티’가 실력을 갖춘 중국 중저가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 사이에 끼어 위기를 맞고 있다.

K뷰티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앞세워 2000년대 초부터 중국 화장품 시장을 지배했다. 미샤,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스킨푸드 등이 주역이었다. 하지만 미샤는 주력 시장인 한국과 중국에서 고전하다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더페이스샵은 지난해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했다. 토니모리와 클리오는 올 들어 ‘중국 매장 폐점’을 선언했다. 한국 시장을 석권한 올리브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올리브영에서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왕음 씨는 “10개였던 매장을 작년 말 6곳으로 줄였고 올 들어 2개 매장을 더 폐점해 현재 4곳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2곳을 더 닫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실상 ‘철수’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중저가 화장품 시장의 지배자가 중국에서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주저앉은 셈이다.
국내 브랜드 가운데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후 등 최고급 브랜드와 신선한 콘셉트로 새롭게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 신생 브랜드뿐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전했다.
치고 올라오는 중국 중저가 화장품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중요한 이유는 달라진 중국의 소비 트렌드와 중국 현지 업체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값싸고 품질 좋은 화장품’ 시장은 중국 현지 브랜드에 넘어갔다. 인지도 조사에서도 중국 현지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다. 명확한 콘셉트로 최근 인기를 끄는 중국 신생 화장품 브랜드로는 퍼펙트다이어리를 꼽을 수 있다. 이 브랜드는 출시 2년 만인 지난해 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목표는 5000억원으로 잡았다.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다 최근 광저우에 대형 매장을 냈다. 이 브랜드는 세련된 색감의 아이섀도, 중국인이 선호하는 색상으로 구성한 섀도 팔레트 등을 주력 상품으로 팔고 있다. 이 회사는 소비자 성향을 직접 분석해 잘 팔릴 수 있는 제품만 선보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 사실상 빅데이터 회사란 평가도 받는다.
또 다른 중국 화장품 FEY는 화려한 색조 화장품으로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평상시엔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과 펄 없는 색조화장을 즐기는 중국 여성들에게 “파티에선 더 화려하게”를 외치는 브랜드다. 펄 입자를 아예 더 크게 만들어 반짝임을 극대화하는 역발상 전략으로 젊은 층을 공략했다. 김연준 코스맥스차이나 연구원장(전무)은 “몇 년 전만 해도 개별 화장품을 판매해 매출을 올리는 데만 치중한 중국 현지 브랜드들이 이젠 젊은 소비자들 성향을 반영해 독창적인 콘셉트를 잡는 단계로 진화했다”며 “한국산 화장품보다 더 경쟁력 있는 중국 브랜드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럭셔리 시장은 일본으로
또 다른 시장은 럭셔리 시장이다. 상하이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신스제다완백화점은 최고급 백화점이다. 2015년 개점한 뒤 화장품 매출이 매년 40%씩 늘고 있다. 1층 전체에는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46개가 입점해 있다. 화장품 매장에는 하루 종일 손님이 북적이고, 매장을 나가는 손님들 손에는 랑콤 디올 등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시세이도와 슈에무라, SK-Ⅱ 등 일본 브랜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브랜드는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한국 대신 일본으로 여행을 간 중국 여행객들이 일본 화장품을 사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919억위안(약 45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이 시장에서 K뷰티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이=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노경목의 선전狂시대] "무역전쟁은 미국 내부 사정 때문" 포퓰리즘 학습 꽂힌 중국](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01.1934980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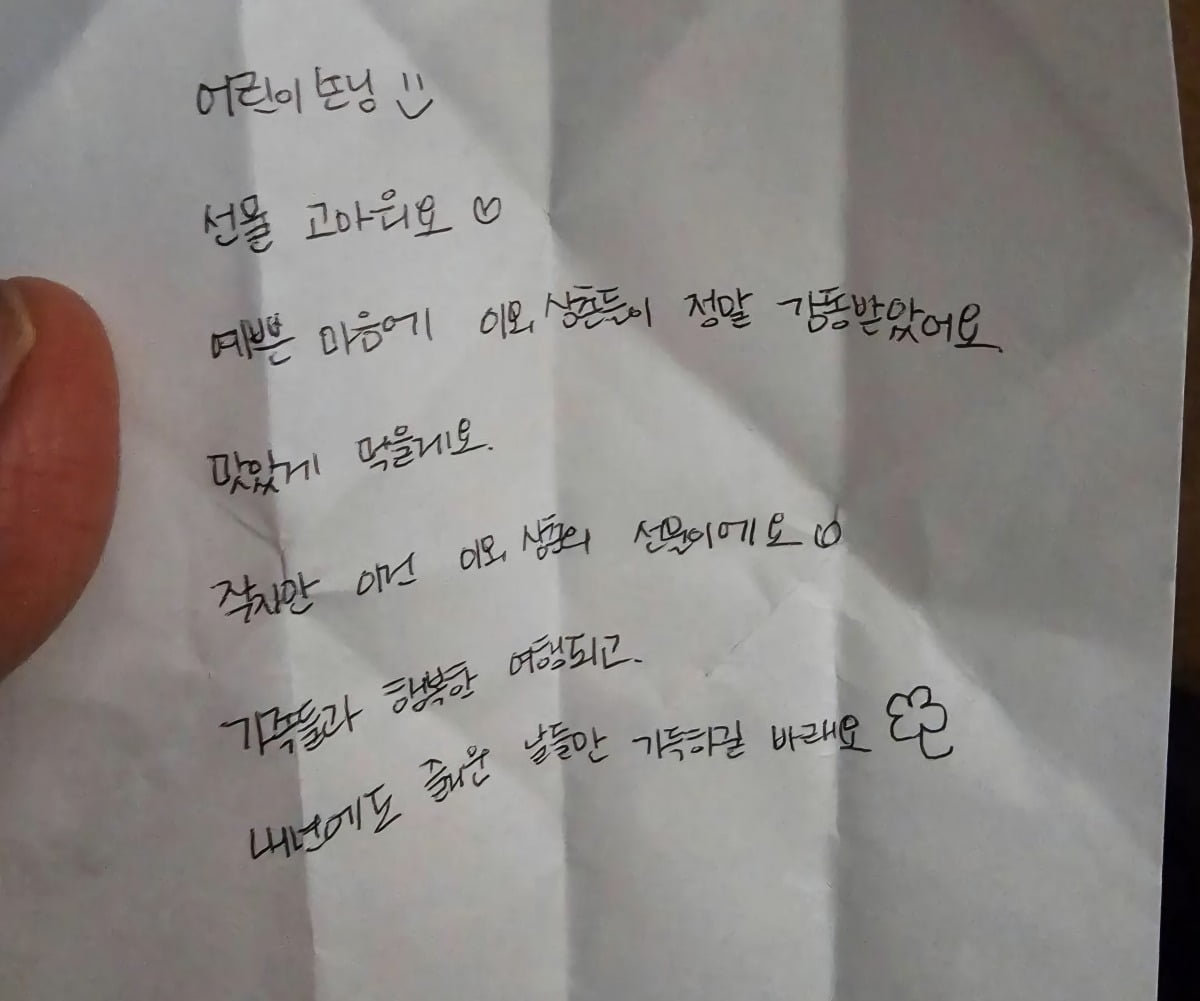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76437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