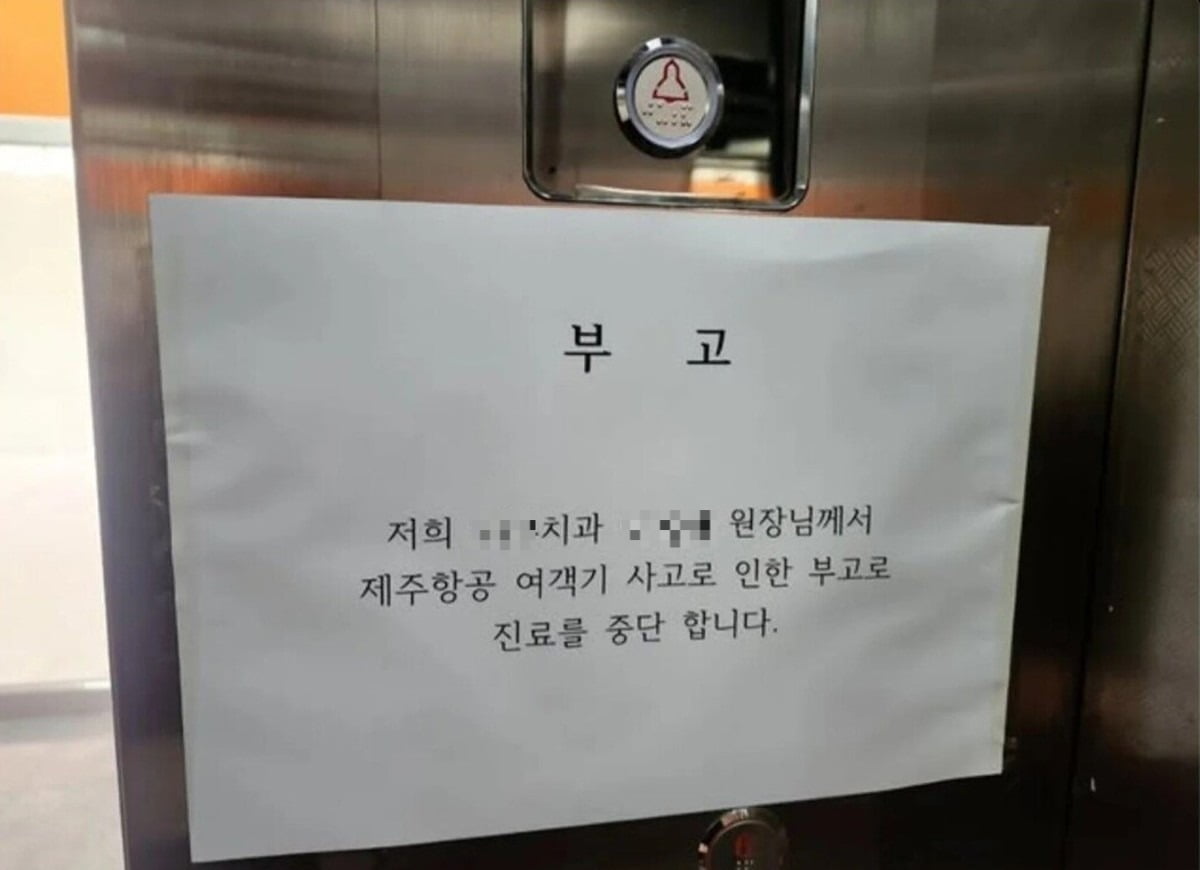美서 '오뚜기 라면가격 담합 집단소송 승소'
이끈 김재영 화우 변호사

김재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사진)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앞둔 기업들에 “담합 혐의를 벗으려면 미국에 진출하는 시점부터 무죄 증거를 모아야 한다”며 “경쟁사 가격 동향을 조사할 때도 정보 출처를 정확히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조인 경력 24년의 김 변호사는 화우 공정거래팀에서 담합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그는 류송 변호사 등과 함께 미국 대형마트 더플라자컴퍼니가 식품회사 오뚜기, 오뚜기아메리카 법인을 상대로 2013년 7월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오뚜기 측을 자문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2013년 3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 농심 등 라면 제조업체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단초가 돼 미국까지 불똥이 번진 사건이다. 지난해 말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법원은 오뚜기가 미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라면가격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달에는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7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김 변호사는 “미국 민사재판에선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는 검사 또는 피고가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를 공개해 재판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국에는 형사소송에만 있지만 미국에선 민사소송에도 있다. 손해입증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는 한국 민사소송과 달리 미국에선 원고가 법정 싸움을 시작하면서 요청한 모든 자료를 피고가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 없는 제도다 보니 제대로 된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해당 회사 직원들의 몇 년치 메신저 대화나 회의록 내용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료를 삭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뚜기의 디스커버리 과정에서는 라면회사들 간에 경쟁사 가격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가격담합을 모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반적으로 담합은 담합 의혹을 받는 기업들의 제품값이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하게 바뀌면서 기업끼리 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왔을 때 인정된다. 김 변호사는 “경쟁사 가격 조사가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을 뿐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철저히 대비하면 소송에 휘말렸을 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에서 가격 담합이 인정되면 원고 손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한국처럼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를 보전받을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오뚜기는 명예를 중시해 재판까지 갔지만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증거를 공개하기 전이나 공개한 뒤 합의를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품 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등과 관련해 유리한 증거를 모아놓으면 합의를 이끌기가 쉽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진출 후에는 경쟁사 정보 수집 등을 하더라도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냈는지 출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업계 협회나 각종 간담회 등에서 얻은 정보들은 출처를 기록해 놓으면 경쟁사와 정보 교류를 했다는 시비를 피하는 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