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부진 '늪'에 빠진 자전거 업계…전기·공유자전거로 돌파구 찾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세먼지로 자전거 판매 '뚝'
생활형 이동수단으로 수요층 확대
생활형 이동수단으로 수요층 확대

‘내리막길’ 질주 중인 자전거산업
국내 자전거업계가 전기자전거와 공유자전거에서 생존 활로를 찾고 있다. ‘퍼스널모빌리티(개인용 이동수단)’와 공유서비스 확대 등 트렌드에 맞춰 가며 미세먼지로 인한 실적 악화 등 불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호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겨울 한파가 길어진 데다 미세먼지까지 극성을 부렸다. 자전거업체의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삼천리자전거는 지난해 매출이 796억원으로 전년보다 28.4% 급감했고, 영업손실 17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알톤스포츠는 지난해 23억원 영업손실을 내며 2015년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업계는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올해 전기자전거 확산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레저용 자전거가 중심이었지만 미세먼지 영향으로 레저활동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생활형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 수요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작년 3월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모터와 함께 페달을 구르는 파워어시스트(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도 전기자전거 수요 확산의 계기가 됐다.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업계는 올 들어 100만원 이하의 모델을 내놓고 대중화에 나섰다. 삼천리자전거는 필수적인 기능만을 갖춘 전기자전거 신제품 ‘팬텀이콘’을 출시했다. 소비자가격 69만원의 대중화 모델이다. 도시형 모델 팬텀어반(87만원)과 접이식 모델 20팬텀 마이크로(89만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다. 알톤스포츠는 접을 수 있는 전기자전거 ‘니모FD’를 86만원에 내놓는 등 올해 100만원 미만 전기자전거 4개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며 전기자전거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알톤스포츠는 미국, 일본 시장 수출에서도 돌파구를 찾고 있다. 세계 3대 바이크쇼로 손꼽히는 중국의 상하이 국제 자전거 박람회와 독일의 유로바이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해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새로 나왔어요] 삼천리 '팬텀제로 핑크에디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69113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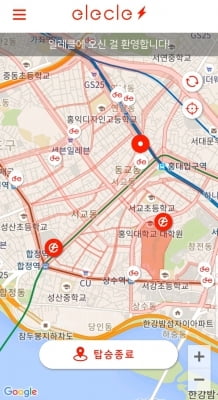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