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채권 시가평가하라"…반세기 '검은 거래' 관행 뒤바꾼 혁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 자본시장을 뒤흔든 사건
(23) 2000년 7월 채권 시가평가 시행
(23) 2000년 7월 채권 시가평가 시행

개츠비는 어떻게 미국 뉴욕의 대저택에서 매주 성대한 파티를 열었을까. 1925년작 미국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주인공 제이 개츠비는 화자(話者)인 닉 캐러웨이와의 짧은 대화에서 이 미스터리를 풀 힌트를 남긴다. 개츠비가 월가에서 일하는 캐러웨이에게 “채권을 판다고 했죠?”라고 물은 뒤 ‘비밀스러운’ 돈벌이를 소개하는 대목에서다. 대화는 캐러웨이의 거절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지만, 소설은 곳곳에서 32세 청년 개츠비가 불량 채권을 팔았음을 암시한다.
대다수 일반인은 채권을 그저 ‘원금과 이자를 적어둔’ 따분한 종잇조각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 종류와 규모는 역사적으로 늘 주식시장을 압도했고, 일확천금의 기회가 넘쳐났다. 그리고 채권시장의 ‘짜릿한’ 거래는 개츠비의 대사처럼 대부분 ‘비밀스러운 종류의 일’이었다.
가격표 없는 ‘암시장’

이 가격표는 숫자에 능한 ‘점원’(채권평가사)이 ‘손님’(투자자)의 동향을 살펴 매일 새로 써 붙인다. 은행 이자율이 떨어진 날엔 예금을 빼온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쏜살같이 가격을 올려 붙인다. 이 같은 ‘시가평가 가격’은 채권시장의 가격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초창기 채권시장은 달랐다. 가격표 없는 암시장에 가까웠다. 《위대한 개츠비》의 무대였던 ‘광란의 1920년대(roaring twenties)’는 이런 가격 불투명성을 이용한 채권 사기가 성행하던 시기였다. 기업들은 앞다퉈 마천루를 올리며 돈을 향한 무한한 갈증을 드러냈고 ‘쓰레기 채권(junk bond)’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해방 후 빠르게 산업화를 추진했던 한국도 비슷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은행은 항상 초과수요 상태였다. 급증한 기업의 자금 수요는 명동을 중심으로 불량 채권을 쏟아냈다. 개인도 낮은 예금 이자를 대체할 고수익 상품에 혈안이었다. 1000원짜리 채권을 1만5000원에 팔 수 있는 거대한 암시장이 열린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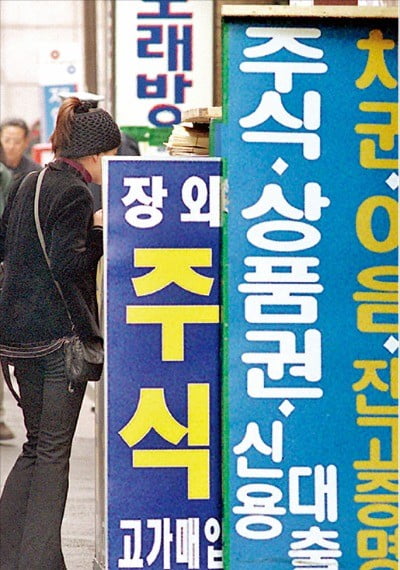
“어디서 2억원만 빌려봐요. 3% 떼 줄테니.”
김형진 세종그룹 회장은 그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이렇게 기억한다. 명동 채권시장에서 출발해 세종증권을 운영했던 그는 1980년대 초 부도 위기에 몰린 한 기업인에게서 ‘자금조성비’ 지급 제안을 받는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의 월급여(30만원)의 스무 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누가 현금을 갖고 있다’는 정보의 대가였던 넉넉한 자금조성비는 사채(私債) 시장을 독버섯처럼 키워내는 젖줄이었다. 수익을 내는 방식에 따라 선이자(어음할인), 수수료, 매매 차익처럼 표현은 달랐지만 기본 구조는 같았다. 채무자에게 액면금액(빌리는 돈)보다 적은 현금을 내주고 차익을 챙기는 구조였다. 값을 깎아(할인해) 매입한 채권은 더 비싼 값에 다수의 개인에게 팔려나가기도 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명령 ‘8·3 사채동결 조치’로 처음 드러난 이 같은 사채시장의 규모는 무려 3456억원. 당시 협의통화(M1·현금과 요구불예금)의 80%에 달했다. 2019년 현재 협의통화를 적용하면 700조원 규모다.
사채시장의 뛰어난 이문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전설의 거부’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창업자가 대학원생 시절 주식을 배우러 찾아갔던 ‘백할머니’ 백희엽, ‘광화문 곰’ 고성일, ‘사채왕’ 단사천 등이 이름을 떨쳤다. 채권시장의 맛을 본 20대 김형진 회장도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명동에 사무소를 차렸다. 그는 주로 첨가소화채권(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살 때 의무 매입하는 소액의 국공채)을 싸게 사 모은 뒤 되팔면서 서른 즈음에 20억원을 쥐었다.

‘장 여인 관련 어음 총 2624억원.’
놀라운 자금조성비의 실체는 1982년 5월 터져나온 장영자·이철희 부부의 천문학적인 어음사기 사건 보도로 처음 만천하에 드러났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대기업조차 사채시장으로 내몰렸던 때였다. 장씨 부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금 부족에 시달리던 공영토건 등에 576억원을 주면서 다섯 배인 2624억원어치 채권(견질어음)을 담보로 요구했다. 이 담보를 약 1400억원을 받고 단자회사(투자금융회사) 등에 다시 팔아 별장과 금괴, 고려청자 등을 사는 데 썼다.
경제 위기가 부른 검은돈의 규모는 이듬해 여름 명성그룹의 몰락으로 또다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김철호 명성그룹 회장은 1000명의 전주(錢主)를 상대로 사채자금 1066억원을 조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44억원은 자금조성비(선이자)로 다시 사채업자에게 돌아갔다. 1979년 명성콘도(현 한화리조트) 설립 이후 5년 만에 20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그룹으로 성장한 미스터리의 실체였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기에 놀란 정부는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감시하는 신용평가사 설립을 서둘렀다. 1985년엔 이헌재 초대 사장이 이끄는 한국신용평가가 종합금융회사 등의 출자로 탄생했다. 1986년엔 은행들의 출자로 전국종합신용평가(현 NICE신용평가)가 세워졌다. 이듬해엔 한국산업은행 자회사인 한국경영컨설팅이 한국기업평가로 이름을 바꾸고 신용평가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크게 10단계(AAA~D)의 등급으로 채권가격의 ‘구획’을 세워 대강의 가격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광란의 1990년대
“투신사(자산운용사) 채권운용부장을 거치면 집 한 채가 떨어진다.”
채권가격의 불투명성을 활용해 검은돈을 벌어들이려는 사채시장의 탐욕은 장영자 사건 이후에도 위기 때마다 마수를 드러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1999년 2월 국회 한보사건 조사 청문회에 나와 “1조원을 5년간 빌리면 자금조성비로 6000억원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자회사가 브로커를 끼고 사채시장을 연결해줬다”며 제2금융권과의 ‘검은 연결고리’를 폭로했다.
자산운용업계의 공룡 ‘3투신’(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국민투자신탁)도 예외는 아니었다. 명동에서 번 돈으로 1998년 세종증권(당시 동아증권)을 인수한 김형진 회장은 투신사 간부들에게 검은 거래의 대가로 억대 사례금을 지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1999년 8월 300억원(액면금액)짜리 신동방 채권을 202억원에 산 뒤 같은 날 투신권에 267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단 한 번의 거래로 65억원을 번 셈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1998년에만 1조7000억원어치 채권을 매매해 53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30대 그룹 가운데 3분의 1이 무너진 외환위기 당시 채권시장은 광란의 시대였다. 법원은 그의 ‘무허가 영업’만 문제 삼아 4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의 ‘짜릿한’ 거래를 당시 재판부는 “같은 행위가 이전에는 별 단속없이 관행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은행과 종금사가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채권 창고는 얼마나 썩었는지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선 모든 채권의 시가평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닦달했다.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하던 금융감독위원회는 결국 2000년 7월부터 시가평가의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
채권시가평가 전면 시행
시가평가 시행은 한국 채권시장 역사에 혁명적인 전기를 만들었다. 신용평가사들은 2000년 봄부터 ‘민간 채권평가 3사’(현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를 잇따라 설립하고 ‘채권 대형마트’ 점원처럼 매일 체계적으로 모든 가격을 공시하기 시작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채권 펀드의 실적은 그동안 채권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받아들였던 일반인의 인식도 바꿔놨다. 펀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부실 채권의 매입도 급격히 줄었다. ‘누가 얼마에 사고 파는지’ 정보의 대가였던 사채시장의 자금조성비는 얄팍해졌고, 제도권 채권 유통(매매) 시장은 급성장했다.
하지만 방대한 종목 수 때문에 인터넷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점두거래(장외거래) 방식은 여전히 ‘은밀한 거래’의 유혹을 낳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5년 채권 거래와 관련한 증권사 직원과 펀드매니저 간 불법 관행을 수사해 무려 148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채권발행잔액은 약 2만4000종 1940조원에 달한다. 한 달 거래대금은 400조원, 건당 기본 거래단위는 100억원이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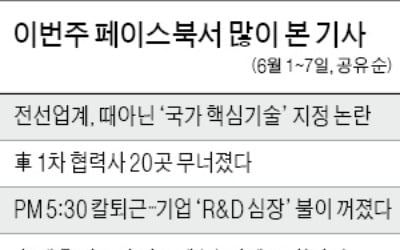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