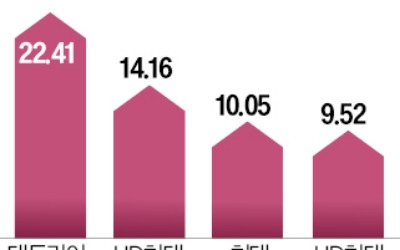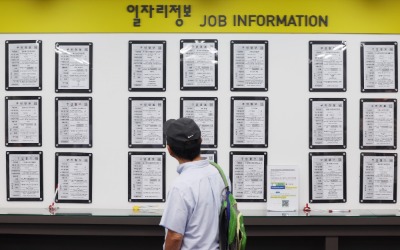겉치레 이념과 어설픈 명분 떨치고 ‘본질’ 추구
문 대통령 방문할 살트셰바덴서 교훈 새기길
이학영 논설실장

북유럽 3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방문지, 살트셰바덴은 그랬던 스웨덴의 비극을 끊어낸 기념비적 도시다. 1938년 스톡홀름 외곽 휴양지인 이곳에서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 대표가 노사관계의 항구적 안정을 약속하는 협상문서에 서명했다. ①노조는 경영자의 지배권, 경영자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②경영자는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에 힘쓰며 ③기업들은 이익금의 85%를 사회보장 재원(법인세)으로 내놓는다는 게 골자였다.
상호 포용에 기반을 둔 노사합의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살트셰바덴 협약은 체결된 지 8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틀이 지켜지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살트셰바덴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립을 극복하고, 합의의 정신을 정착시킨 장소”라고 의미를 부여한 대로다.
스웨덴은 이 협약을 계기로 극심했던 노동쟁의가 자취를 감추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몇 가지 있다. 살트셰바덴 협약에 참여한 기업 대표는 사실상 발렌베리그룹 한 곳이었다. 그만큼 당시 스웨덴에서 압도적 존재였다.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ABB, 스카니아, 사브 등 스웨덴 대표 기업을 배출한 발렌베리그룹은 지금도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0%를 넘나들 정도로 존재감이 막강하다. 스웨덴 내에서 ‘해체론’이 들끓었지만, 사회민주당 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오히려 경영권 안정 장치를 제공했다. 창업주인 발렌베리 가문에 주당 의결권이 10~1000개인 황금주(golden share)를 인정해준 것이다.
스웨덴 노·사·정이 ‘말도 안 돼 보이는’ 파격적 내용에 합의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어떻게 하는 게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 최대한 많은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만 집중했다. 겉치레 이념이나 본말을 전도하는 어설픈 명분은 배격했다. 스웨덴이 왜 ‘실용의 나라’로 불리는지, 정수(精髓)를 보여줬다. 스웨덴 노·사·정은 또 협약의 정신에 충실할 뿐, 자구(字句)를 갖고 스스로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 나라 곳간이 빈약했던 협약 당시에는 기업들에 사회안전망 재원(財源)을 떠안길 수밖에 없었다. 법인세율을 85%로 정했던 배경이다. 그러나 이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급증하자 즉각 인하에 나섰다. 법인세율은 현재 22%로 떨어졌고, 2021년까지 20.6%로 더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는 2005년에 아예 폐지했다.
좌파정당이 주도해 온 북유럽 국가들의 ‘탈(脫)이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공 서비스 민영화다. 의료 통신 발전(發電) 등을 민간에 넘긴 데 이어 우정사업과 산림관리까지 민영화를 이뤄냈다. 북유럽 국가들의 이런 정향(定向)을 ‘실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가장 살기 좋게 하는가”에 모든 정책 결정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상(現象)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라”며 강조한 ‘제1원칙 사고(first principles thinking)’가 북유럽 국가를 역동성 넘치는 나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배경을 설명하면서 “역점 과제인 ‘혁신 성장’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꼽았다. 진정한 혁신과 성장, 포용을 이뤄낸 이들 국가의 비결에 온전히 눈뜰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순방으로 기억될 것이다.
haky@hankyung.com


![[이학영 칼럼] '착한 소득격차 확대' 는 축복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07.14213011.3.jpg)
![[단독] "손 꼭 잡고 다니던 부부"…알고보니 100억 사기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9061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