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스타트업 상장…적자여도 괜찮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스타트업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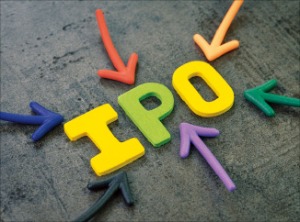
주식시장 상장은 만만찮다. 정석대로면 ‘규모’와 ‘이익’이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밟을 수 있다. 투자받을 때마다 외형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스타트업들이 충족하기 힘든 조건이다.
최근엔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2017년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불리는 적자기업 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상장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만성 영업손실에 시달리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나스닥시장 상장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해 제도를 정비했다.
이 방식의 기준은 외형이다. 시가총액 500억원, 매출 30억원, 2년 연속 매출 증가율 20%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시총이 크거나 자기자본이 많으면 다른 조건이 조금 처져도 상장이 가능하다. 작년 2월 카페24가 상장할 때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기술이 아니라 사업모델의 독창성을 기준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제도도 있다. 첫 사례는 번역 데이터 업체 플리토로 다음달 상장할 예정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