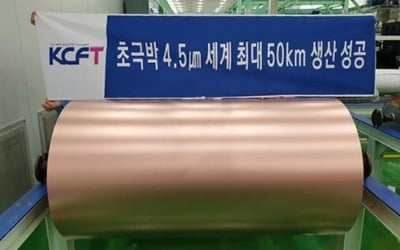LG오너들 경영철학 집대성
"편법 동원해야 한다면 1등 안해도 된다"
"사람 함부로 자르지 말라"

“아무도 만들지 않는 상품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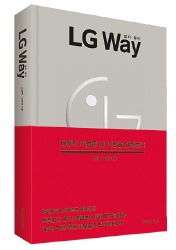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만 한다.” 구인회 창업자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념이다. 국내 최초의 화장품 ‘럭키크림’을 개발한 그는 1951년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변에선 ‘망하는 길’이라며 말렸다.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설이 나돌 때였다.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활필수품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생산업자가 국민의 생활용품을 차질 없게 만들어내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다.”
구 창업자는 ‘꼭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도 만들지 않는 상품만을 만든다’는 원칙도 세웠다. 당시 엄청난 수익성을 자랑하던 ‘삼백(제분·제당·면방직) 산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이유다.

1970년 취임한 구자경 명예회장은 총수의 권한을 전문경영인에게 넘겨 자율 경영 체제의 기반을 닦았다. 다른 그룹들은 오너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제왕적 경영체제’를 공고히 하던 때다. 1980년대 후반 LG그룹의 노사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의 일이다. 구 명예회장이 ‘회장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만나주지 않자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는 총수가 직접 노조와 담판을 지으면 자율 경영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판단했다. “사장들에게 전권을 넘겼습니다. 사장이 안 된다면 나도 안 되고, 사장이 된다고 하면 나도 됩니다.” 이때의 파업은 금성사(현 LG전자)가 삼성전자에 1위 자리를 내주는 결정적 계기였지만 구 명예회장은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1995년 구본무 회장이 취임했을 때 주요 경영진은 그가 ‘정도’를 앞세우는 것을 우려했다. 취임하자마자 공정문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우리 관계사라고 해도 품질이 떨어지면 절대 납품받지 말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쟁사와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던 사업부서에선 정도를 걷는 것만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그는 더 힘있게 밀어붙였다. 계열사의 한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구본무 회장은 늘 ‘1등 LG’를 강조했지만, 편법을 써야 하는 일이라면 아예 1등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없는 LG
일각에서는 4세 경영 체제를 시작한 LG그룹을 보며 “새 총수 시대를 맞아 그룹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일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LG그룹이 오랜 기간 축적한 경영철학을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본무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에도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은 것은 구본무 회장 시절인 2003년 대기업 처음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해 자율 경영 체제를 구축한 덕분이다.
16분기째 적자를 내고 있는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 인력을 다른 사업부로 전환 배치한 데는 임직원을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는 LG그룹의 오랜 인사 방침이 반영됐다. 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투명하게 납부하겠다고 발표하고, 판토스 지분 등을 전량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한 일도 ‘정도경영’의 하나로 꼽힌다. 70년 축적의 역사는 ‘사랑받는 기업’ LG의 단단한 토양이 됐다는 게 경영계의 평가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