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뒷전' 판매사도 책임…불법 OEM 펀드까지 요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운용사 급증에 판매사 입김 세져
펀드구조 요청하고 운용까지 관여
일부 PB는 성과보수 요구하기도
펀드구조 요청하고 운용까지 관여
일부 PB는 성과보수 요구하기도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의 급성장 배경에는 판매사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되자 펀드 판매사들은 사모시장을 중심으로 한 헤지펀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은행과 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들도 관리하기 까다롭고 큰돈이 들어오지 않는 공모펀드보다 한 번에 거액을 유치할 수 있는 헤지펀드를 선호했다. 한 은행은 아예 올해 목표를 ‘헤지펀드 판매’로 내세웠다.
여기에다 2015년 말 헤지펀드 진입 규제 완화를 계기로 전문사모운용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상품을 팔아달라는 운용사는 많은데 판매사는 한정돼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판매사들의 ‘입김’이 세졌다. 시장 과열과 함께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판매사들은 경영난에 빠진 일부 헤지펀드 운용사들을 끌어들여 ‘불법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만들기도 했다. OEM 펀드란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제시하고 펀드 설정과 운용에까지 관여하는 펀드다. 현행 자본법상 OEM 펀드는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매사인 농협은행 요구에 따라 OEM 펀드를 만들고 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설정과 운용을 지시한 농협은행도 징계안이 검토되고 있다.
헤지펀드업계 관계자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일단 운용자산 규모부터 늘리고 보자는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많다”며 “판매사들의 유혹을 이겨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펀드에 담을 채권과 주식 등을 미리 정해놓고 운용사에 ‘비이클’만 빌려달라고 대놓고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단기에 자산이 급증한 헤지펀드 운용사들을 의심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PB들은 펀드 성과보수 일부를 자기 몫으로 요구하기도 한다는 게 헤지펀드업계의 전언이다. 수수료 취득과 이직을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하로 짧은 상품만 판매하는 PB들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 시장에서 불거졌던 판매사 문제가 헤지펀드 시장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여기에다 2015년 말 헤지펀드 진입 규제 완화를 계기로 전문사모운용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상품을 팔아달라는 운용사는 많은데 판매사는 한정돼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판매사들의 ‘입김’이 세졌다. 시장 과열과 함께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판매사들은 경영난에 빠진 일부 헤지펀드 운용사들을 끌어들여 ‘불법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만들기도 했다. OEM 펀드란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제시하고 펀드 설정과 운용에까지 관여하는 펀드다. 현행 자본법상 OEM 펀드는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매사인 농협은행 요구에 따라 OEM 펀드를 만들고 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설정과 운용을 지시한 농협은행도 징계안이 검토되고 있다.
헤지펀드업계 관계자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일단 운용자산 규모부터 늘리고 보자는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많다”며 “판매사들의 유혹을 이겨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펀드에 담을 채권과 주식 등을 미리 정해놓고 운용사에 ‘비이클’만 빌려달라고 대놓고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단기에 자산이 급증한 헤지펀드 운용사들을 의심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PB들은 펀드 성과보수 일부를 자기 몫으로 요구하기도 한다는 게 헤지펀드업계의 전언이다. 수수료 취득과 이직을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하로 짧은 상품만 판매하는 PB들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 시장에서 불거졌던 판매사 문제가 헤지펀드 시장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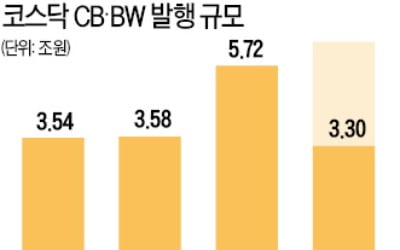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