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교류 창구 역할을 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일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가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중단을 선언했고, 서울시도 중단을 검토 중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50곳이 일본상품 불매에 동참했고,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행사가 취소된 사례는 셀 수도 없다. 서울 중구청이 명동 등지에 ‘노 재팬’ 깃발을 내걸었다가 철회한 일도 있었다.
급기야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계가 그제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정치외교적 문제 때문에 민간교류까지 막는 건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내국인의 일본관광 급감에 이어,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여행 취소도 가시화돼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심정일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일본 관광금지구역 확대 등의 극단적 주장까지 쏟아내는 판국이다.
이런 식의 관(官)주도 반일운동은 민간의 자발적 불매운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에 하등 도움이 안 될뿐더러 국제규범에 비춰봐도 부적절하다. 정치적 이유로 올림픽을 거부하고, 민간교류를 막는 나라라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정부 간 갈등을 빚더라도 민간교류는 지속돼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교란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했듯이, 민간교류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기대할 수 없다. 분노할 대상은 일본 정부의 치졸한 처사이지, 일본 국민이나 문화가 아니지 않은가. 치졸함을 편협함으로 맞서지는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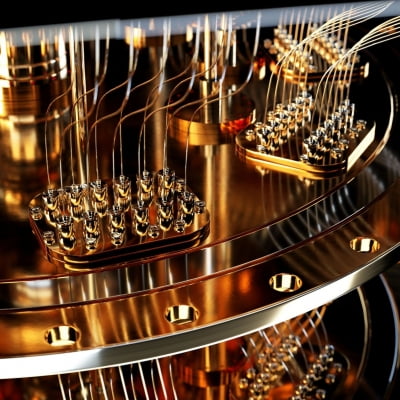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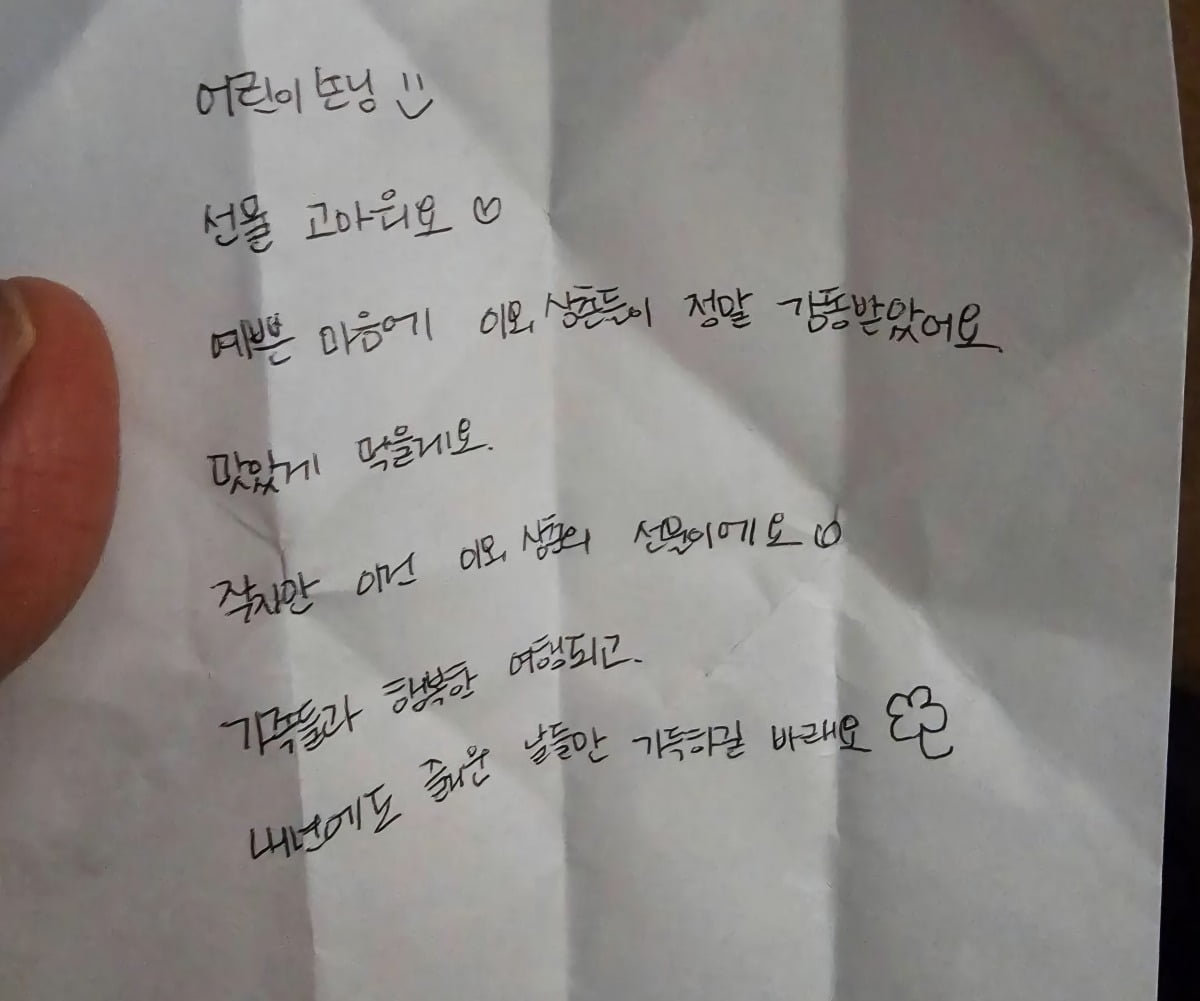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4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764375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