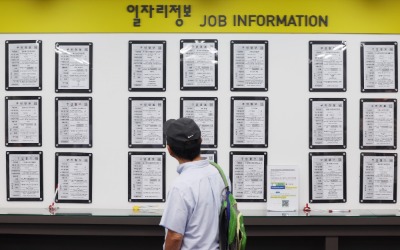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을 2심보다 50억원 많은 86억여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액수를 모두 인정하자 "롯데그룹은 1, 2심에서 뇌물이 이미 인정된 만큼 사안이 다르다"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은 인정됐지만 강요에 의한 수동적 공여란 판단에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처벌이 낮아졌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 맞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의 엄격한 판결기조가 확인되면서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단독] "손 꼭 잡고 다니던 부부"…알고보니 100억 사기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9061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