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 된 韓·中·日 고대사 연구…근대 기반 해석 버려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이성시 지음 / 박경희 옮김
삼인 / 352쪽 / 2만8000원
이성시 지음 / 박경희 옮김
삼인 / 352쪽 / 2만8000원

‘일본서기’에 따르면 주아이 천왕이 즉위 9년(199년) 규슈 남부의 구마소 일족을 치러 갔다가 급사하자 진구왕후는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향했다. 보물이 많은 신라를 먼저 치면 구마소 일족은 자연히 항복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다는 것. 진구왕후 일행이 바람과 파도, 큰 물고기들의 도움을 받아 순식간에 신라에 이르자 신라 왕은 신하의 예를 취하기로 맹세하고 배 80척에 공물을 실어 일본 군대를 따르게 했다. 신라가 일본에 복속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 왕과 백제 왕은 스스로 일본 진영에 찾아와 신하가 돼 조공을 바치기로 했고, 진구왕후는 이 땅을 조정의 직할 영지로 삼고 삼한이라고 일컬었다는 게 삼한정벌 설화의 요지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조작되고 윤색된 ‘일본서기’ ‘고서기’에 기록된 삼한정벌 설화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실(史實)로 여겼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며 고대로부터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강변해왔다. 임진왜란, 조선 병탄은 물론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같은 차원에서 인식했다. 침략이 아니라 옛 영토의 회복이라는 얘기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극복하기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자는 인식 주체가 처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고대사 연구의 한계를 거듭 지적하면서 역사 연구가 국가주의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대사 연구가 18~19세기 국민국가 형성기의 이데올로기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 역사를 각국의 틀, 즉 일국사(一國史)의 틀에서, 그것도 근대라는 콘텍스트에 맞춰 해석해온 결과 원래의 실체와 다른 역사 왜곡을 낳고, 역사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역사를 각각 구성함으로써 고대사가 하나의 전쟁터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일본은 삼한정벌설에 바탕해 조선을 침략하고, 한반도보다 일본이 우월하다고 여겨왔다. 왜군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진구왕후 신사에 들러 참배했고, 메이지 정부는 조일수호조규로 조선을 개항시켜 침탈을 본격화할 때 진구왕후의 초상이 그려진 화폐를 발행했다. 조선을 강제 병탄한 뒤에는 양국 관계가 드디어 2000년 만에 원상 회복됐다는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선 선진 문화를 가진 북방의 기마민족이 일본에 진출해 야마토 조정을 세우고 통일국가를 형성했다는 기마민족 정복설, 삼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분국(分國)을 세웠고, 분국이 고대국가로 통일됐다는 분국론이 제기됐다.
발해사는 한국과 중국의 전쟁터다. 한국은 고구려계가 지배층을 형성하고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으므로 한국사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말족이 피지배층의 대다수였으므로 말갈인이 운영한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맞선다.
광개토왕비는 한·중·일의 삼국 전쟁터다. 중국은 동북공정에 의해 고구려를 자기 역사에 편입하고 있다. 일본은 비문의 1775자 가운데 ‘백제·신라는 원래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조공하고 있었는데 왜가 신묘년부터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쳐부수고 왜의 신민으로 삼았다’는 ‘신묘년 조’ 32자를 내세우며 삼한정벌론, 임나일본부설과 결부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선 비문 조작설을 제기해 지금도 논란이 분분하다.
저자는 “1990년 이후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포스트콜로니엄 상황, 국가체제나 경제적 지배로서의 식민지 통치가 끝났음에도 의식구조나 자기동일성 양상으로서의 식민지체제가 존속하는 상태”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일국사를 넘어서는 광역권에서 새로운 역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면 근대의 콘텍스트에 끌어당겨진 고대를 고대의 콘텍스트에서 다시 읽는 작업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화동 문화선임기자 fireboy@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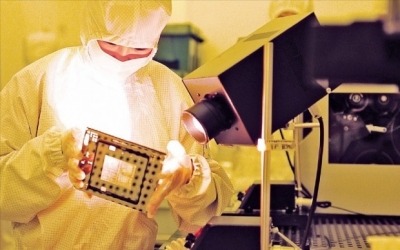
![[책마을] '100세+α시대' 길어진 노년…나이듦에 대처하는 법](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391771.3.jpg)
![[책꽂이] 돈의 감각 등](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392760.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