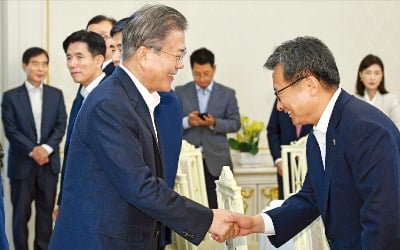日 기업에 자극받아 감속기 개발
전량 일본산 사용하던 삼성전관
브라운관 자동화 라인에 적용
1년여 이상 없자 다른 라인 확대

여영길 사장(사진)은 9일 인천 송도 SPG R&D센터에서 한 인터뷰에서 “끊임없는 R&D 투자로 감속기 시장의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개발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SPG의 국내 감속기 시장 점유율은 현재 51%에 달한다. 국내외 공급처를 확대한 덕분에 지난해 매출 3054억원에 12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대기업과 상생협력이 ‘성장 모멘텀’
여 사장은 정밀감속기의 국산화 이후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성장의 분수령으로 꼽는다. 감속기는 회전운동을 하는 모터에 기어를 연결해 속도를 늦추면서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1995년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당시엔 대기업들이 국산 제품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구하기 쉽고 완성도 높은 일본 제품을 쓰는 게 편했기 때문이다. 여 사장은 “1995년 삼성전관(현 삼성SDI)의 담당자가 브라운관 자동화 라인에 처음으로 SPG의 감속기 사용을 결정했다”며 “일본 제품을 쓰다가 국산 제품을 사용한 뒤 1년 동안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자 다른 라인으로도 확대 공급했다”고 했다. 삼성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SPG는 GE, 월풀 등 세계적 가전업체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었다.

SPG는 협동 로봇의 관절에 사용되는 SH감속기와 산업용 로봇의 관절로 쓰이는 SR감속기를 개발하는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 나노기술이 적용돼야 하는 고급 부품이다. 10월께 국산화에 성공하면 중국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여 사장은 “수술용 로봇에 들어가는 초정밀 로봇용 감속기 개발까지로 확장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1991년 설립한 SPG의 감속기 국산화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자인 이준호 SPG 회장이 일본의 모터공장을 견학 갔을 때 공장 관계자들이 기밀로 분류될 법한 핵심공정까지 상세하게 보여줬다. 이 회장은 일본 업체 관계자들의 ‘한국이 감속기를 절대 개발할 수 없을 것’이란 말에 자극받아 국산화를 결심했다고 한다.
여 사장은 “이 회장과 의기 투합해 일본으로 연수를 간 것을 시작으로 설계부터 생산, 기술개발까지 전 직원과 함께했다”며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 일본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스위스에 수십 차례 연수를 다녀왔고 거기서 핵심 장비를 사왔다”고 1991년 SPG 설립 당시를 되돌아봤다.
SPG는 이후 4년 동안 60억원을 투자했다. 작은 소기업으로선 큰 규모의 자금이었다. 설계는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었으나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여 사장은 “감속기를 제작하기 위한 특수강 소재를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필요한 공구도 다 수입해야 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다행히 국내 특수강 업체가 SPG가 원하는 수준의 소재를 공급해줬다. 이 같은 노력에 SPG의 모기업인 성신이 30여 년간 기어를 생산해오며 쌓은 노하우가 더해져 개발을 시작한 지 4년 만인 1995년 감속기의 국산화가 이뤄졌다.
인천 송도=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