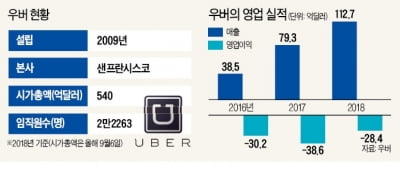현대車의 '제트' 80여대 운영
싱가포르계 '빔모빌리티' 이어
美 유니콘기업 '라임' 이달 상륙

춘추 전국 시대 맞은 공유 킥보드 시장
현대자동차는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서비스 제트를 서울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종로구 혜화역 부근에서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80여 대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용자는 처음 5분 동안은 500원, 추가 1분당 100원씩 낸다. 현대차는 지난달 12일부터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30대와 전기자전거 80대를 투입해 공유 서비스를 테스트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서비스 지역을 서울까지 넓혔다. 업체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외 업체들도 뛰어들었다. 싱가포르계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기업인 빔모빌리티가 지난달 29일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다. 기업 가치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인정받은 미국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라임도 이르면 이달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관리가 쉬워 서비스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택시 사업에 주력하는 카카오도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주로 서울 강남, 가산, 성수 지역과 대학가를 공략한다. 새로운 모빌리티(이동수단)에 익숙하고 관심이 많은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도 이들 지역의 강점이다. 현대차가 새로 진출한 가산 지역은 정보기술(IT) 기업이 많고, 혜화 지역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대학생이 많은 대학가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대도시, 관광지, IT 인력이 많은 지역에서 대학생과 직장인 사이에 공유 전동킥보드 수요가 많다”며 “대기업과 해외 업체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해외처럼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총량제는 공유 전동킥보드 난립으로 골머리를 앓는 나라들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도시교통국(SFMTA)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도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하게 운행된다는 등의 민원이 빗발치자 업체와 운행 대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외 기업과 대기업 공세에 기존 업체들은 규모를 키우며 대응하고 있다. 피유엠피는 2000대를 추가해 30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스아시아는 대전의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알파카를 흡수합병했다. 더스윙도 경쟁 업체인 라이드를 인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들은 보험사와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해 내놓고 있다. 전용 멤버십과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차별화를 꾀하는 곳도 있다.
관련 규제 개선은 ‘제자리걸음’
불붙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지난 3일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코스포는 이용자를 위한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해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또 속도 제한, 주행 규정 등 다른 안전 규제가 법령에 반영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8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운행 중 사고가 34.4%를 차지했다.
지난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은 ‘25㎞ 이하 속도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