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해결된 건 물론 아니다. 미국의 ‘입단속’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미국 측에 ‘공개적인 불만 자제’를 요구한 게 계기가 됐다.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미국도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 내 여론은 불리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미국의 앙금은 풀리지 않았다.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한 워싱턴에 한국 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비공개 석상에선 ‘한국이 제정신이냐’ 같은 심한 말도 나온다.” 한 싱크탱크 전문가가 최근 기자에게 전한 미 조야의 분위기다.
지난달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직후 기자는 미 싱크탱크와 대학의 아시아 전문가 7명에게 이메일로 의견을 물었다. 그때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이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건 학계의 ‘소수 의견’이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통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했을 때만 해도 워싱턴의 분위기는 대체로 “일본이 심하다”는 쪽이었다. 일본의 수출통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할 것이란 한국 정부의 설득 논리가 먹혀드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워싱턴 여론은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정반대 쪽으로 돌아섰다.
미국에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넘어 한·미·일 협력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한·미·일 협력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의 기본축이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깨겠다고 하자 미국에서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오해”(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 “북한과 중국에 준 큰 선물”(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등 격앙된 반응이 나온 배경이다.
한·미 동맹 다져야
지소미아를 한·일 갈등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미·중 패권전쟁의 측면에서도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광장에 올랐을 때부터 미국은 한국의 ‘중국 편향’을 우려했다. 당시 기자가 참석한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선 “한국은 블루팀이냐, 레드팀이냐(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는 원색적인 얘기까지 나왔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만 유리할 뿐”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일본의 수출통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철회돼야 한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도록 만드는 지렛대로 쓸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일본을 움직이게 하려면 미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이제 그 전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시간이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hohoboy@hankyung.com


![[특파원 칼럼] 베트남 내 치열한 한·일전(戰), 최종 승자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07.18714806.3.jpg)
![[특파원 칼럼] 무역전쟁과 中 '심야 경제'](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07.15110652.3.jpg)
![[특파원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8·15축사에 바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29200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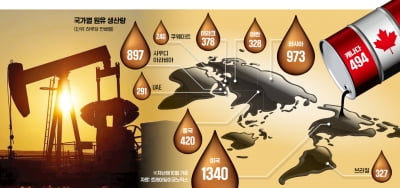

![[속보]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3.1802382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