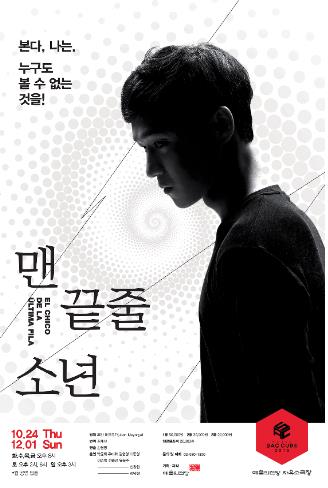패션사업 접고 미술가 변신…"현대인의 내면 파고들었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설치미술가 김혜련 씨 갤러리담 개인전

패션사업을 잠시 뒤로하고 이제 막 미술 인생을 시작한 김씨의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담에서 열린다. 산업사회에 매몰돼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성을 읽어내 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번 전시회 주제를 ‘마음이(Bring to Mind)’로 정하고, 일상의 환희와 그리움은 물론 막연한 설렘을 다양한 오브제로 압축한 근작 20여 점을 걸었다. 전통 색감을 더해 명상적 화면을 창조한 그는 전통 한지나 비단을 사용하고, 물감 등 서양 재료를 다양하게 수용하며 설치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21일 전시장에서 만난 김씨는 “색감의 스며들기나 배어들기를 통해 현대인의 감성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 결과물”이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화려하면서도 슬프고, 고요하면서도 흐느끼는 등 내면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오감을 작품으로 승화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런 생각과 의식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행위를 전통 한지와 직물, 색선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패션 디자인에서 배운 색감과 재질에 대한 노하우를 표제 없는 음악처럼 풀어내서인지 다소 선율적이고 서정적이다. 아무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의 경지에서 형이상학적인 ‘색의 선율’을 짜낸다. 오방색 한지 오브제는 뒷걸음질치고, 가느다란 색선들은 힘차게 달려온다. 격정적인 몸짓에서 우러난 색감들은 감각적이면서도 리듬감이 살아 있다. 미묘하게 움직이는 색선의 파동에서는 속도감과 시간성도 느껴진다.
그의 작품들은 화려한 한지 색채와 융화되는 색선으로 현대인의 의식 흐름을 거침없이 파고든다. 부드러운 오브제의 움직임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꾀하면서 ‘설치미술의 힘’을 보여준다. 작가는 “오브제를 활용한 설치미술 감상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작가가 무엇을 꾸몄는지 알고자 하기 때문”이라며 “답을 얻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을 안다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을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