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기재부…문재인 정부 들어 장·차관 한 명도 배출 못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盧정부 땐 국무위원만 8명 배출
정부 내 이견조율 기능도 약해져
정부 내 이견조율 기능도 약해져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기획재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2017년 5월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던진 말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보수 정부 10년간 정부 관료들이 흘려들었던 우리의 국정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일종의 인수위원회로, 현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밑그림을 그렸던 곳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은 기재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했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견제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정부 지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확대 등 수조원이 드는 사업을 기재부와 충분한 상의 없이 국정과제로 확정지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운영을 보고 이 정부에선 우리 부처 입지가 좁아지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실제로 기재부 위상은 크게 위축됐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내각 곳곳에 기재부 출신이 포진하고 있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 윤진식·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장승우·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만 8명을 배출했다. 부처 ‘맏형’인 기재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균형을 잡고 부처 간 조율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선 행정부처(기재부 제외 17개)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기재부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정부 내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도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 사안을 놓고 기재부와 다른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엇박자’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이 배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부총리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재부가 새로운 화두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던졌는데 지금은 그런 시도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은 기재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했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견제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정부 지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확대 등 수조원이 드는 사업을 기재부와 충분한 상의 없이 국정과제로 확정지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운영을 보고 이 정부에선 우리 부처 입지가 좁아지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실제로 기재부 위상은 크게 위축됐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내각 곳곳에 기재부 출신이 포진하고 있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 윤진식·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장승우·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만 8명을 배출했다. 부처 ‘맏형’인 기재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균형을 잡고 부처 간 조율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선 행정부처(기재부 제외 17개)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기재부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정부 내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도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 사안을 놓고 기재부와 다른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엇박자’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이 배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부총리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재부가 새로운 화두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던졌는데 지금은 그런 시도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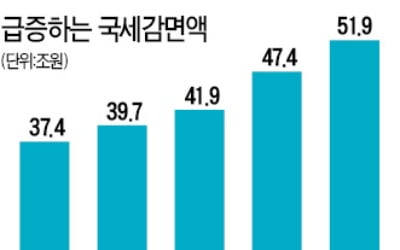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