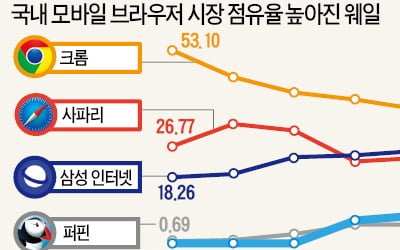포털 자체 대책으로는 한계 존재
트래픽에 종속되는 언론도 문제
대책으로 언론 유료화 목소리

최근 실검이 마케팅이나 정치 여론 형성에 대한 도구로 쓰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조치다. 그럼에도 악성 리플(악플) 등으로 얼룩진 댓글 문제는 방치돼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대형 포털의 뉴스 댓글은 네티즌들이 쏟아내는 혐오스러운 감정의 배설물로 심각하게 오염된 지 오래다. 찬반이나 우호·비우호의 차원을 넘어선 비방과 험담 등 인신 모독적 내용이 넘친다. 이와 같은 악플은 피해자의 정신을 망가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과도 같다. 지난달 25일 삶을 마감한 가수 고(故) 설리(최진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악플이 지목되기도 했다.
악플을 포함한 포털 기사에 달리는 댓글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여러 대책들이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악플 금지법 등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까지 제시된 바 없다. 어떤 댓글을 어떻게 처벌할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의 경우 이미 한국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명제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상태다.

아직까지는 댓글 관리에 있어 포털이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최한 포럼에서 펼쳐진 토론회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법으로 인터넷 뉴스와 검색어 정책을 강제하기보다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문제는 포털이 이제껏 펼친 대책을 되돌아보면 포털의 자체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포털은 뉴스 댓글의 해악이 문제가 될 때마다 로그인 후 이용하기, 신고하기 등 땜질식 대책을 내놓거나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에 책임을 넘기는 데 급급했다.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가 설리의 죽음 이후 “뉴스 댓글에 대해 언론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버티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포털은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네티즌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댓글을 달도록 허용하면서 이를 통해 트래픽 증가라는 상업적 이득을 누려 왔다.
악플이 판치게 된 데에는 언론의 잘못 역시 크다. 국민의 알 권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지나친 가십성 이슈를 생산해 네티즌들의 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자가 바로 기자들이다. 기자로서 변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언론계 자체가 포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트래픽이 언론에게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점, 한국언론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포털의 뉴스 지배력은 77%나 된다는 점 등은 언론사가 포털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다.
국내 언론은 트래픽이라는 요소에 매몰돼 가십 기사를 쓰고,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악플을 쏟아내는 구조 속에 갇혀 있다. 이에 한 연예계 종사자는 “연예인을 향한 악성댓글을 무분별하게 기사에 담는 것은 악플러들의 발언을 가치있는 의견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면서 “사실상 폭력적인 시선을 재생산하는 언론이 악플을 달 기회를 제공하고 장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 인터뷰에서 “악플의 연쇄 구조는 연예인에게는 일단 걸리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개미지옥’”이라며 “개개인의 고소·고발이나 ‘인터넷실명제’만으로 이를 막을 수 없고, 언론 스스로 이를 멈추자는 사회적 선언을 하거나 보도준칙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언론의 포털 유료화는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털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언론에게 돈을 지불하고, 언론은 대신 ‘좋은’ 기사로 답하자는 것이다. 해외에선 이미 유수의 언론들은 모두 유료화가 된 상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선 언론 유료화가 현실화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내가 좋아하는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를 유료 구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매우 많다’고 응답한 한국인 비율은 1%에 불과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