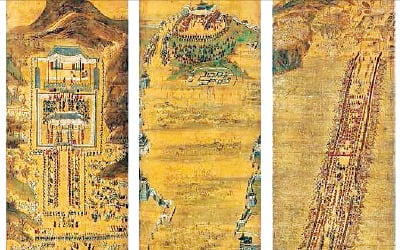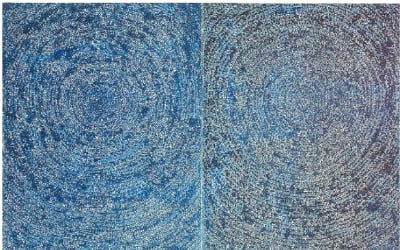'인물, 초상 그리고 사람'展
고희동·김관호·나혜석·박수근
쟁쟁한 화가 51명의 명작 71점
내년 3월 1일까지 대규모 전시
고향 평양 능라도를 배경으로 대동강변에서 목욕하는 두 여인의 뒤태를 서양화 기법으로 담아냈다.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을 실험한 졸업작품이었다. 일본 최대 공모전인 ‘문부성미술전람회’에 출품해 특선까지 거머줬다. 아사히신문은 ‘젊은 조선화가의 도발적인 시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최초의 누드화란 점에서 국내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춘원 이광수는 매일신보에 ‘동경잡신’이란 글로 김관호의 특선 소식을 크게 알리며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하지만 선정성을 이유로 사진을 싣지 않아 정작 조선인들은 작품을 볼 수 없었다.

김관호의 ‘해질녘’을 비롯해 고희동, 나혜석, 배운성,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이인성, 이쾌대, 장욱진, 천경자 등 한국 근현대 거장의 작품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내 최대 화랑 갤러리 현대가 내년 개관 5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개막한 기획전 ‘인물, 초상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다.
미술계 ‘파워 우먼’ 박명자 갤러리 현대 회장이 191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미술의 성장과 발자취를 인물화 장르를 통해 추적한다는 취지로 기획했고, 50년 동안 화랑을 운영하며 친분을 맺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미술평론가 최열, 미술사학자 목수현과 조은정 씨를 기획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울 사간동 본관(현대화랑)과 신관 전시장에 파란만장한 근현대사 흐름 속에서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자신만의 독창성을 화면에 녹여낸 걸출한 화가 51명의 걸작 71점이 걸렸다. 미술사적으로 귀중할 뿐 아니라 평소 만나기 어려운 희귀한 명작들로, 총 보험가액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본관 1, 2층에는 1910~1950년대 제작된 근대미술의 걸작들이 스스로 발화하는 등불처럼 빛과 기운을 힘껏 뿜어낸다. 김관호의 ‘해질녘’에서 발길을 살짝 옆으로 옮기면 도쿄예술대 졸업생인 고희동, 이종우, 오지호, 김용준의 자화상이 관람객을 반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고독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자신을 지탱하려는 나르시시즘이 복합적으로 다가온다. 도쿄예술대 소장품들로 이번 전시를 위해 서울 나들이를 했다.
1930년대 인물화들은 전통적인 미감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오지호의 ‘아내의 상’, 이인성의 ‘가을 어느 날’은 한민족의 본성을 흰색과 황토색 미학으로 승화했다. 일제강점기에 변질되는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독일에서 유학한 배운성의 ‘가족도’(등록문화재 제534호)에서는 당대의 주거·복식문화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40년대 해방 공간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한민족의 미래를 아우른 대담한 시도가 엿보인다. 이쾌대의 ‘군상Ⅲ’에서 보듯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꿈틀거린다.
한민족 내면과 치열한 삶의 흔적
신관으로 이어지는 전시에선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인물화를 만날 수 있다. 아이를 업은 단발머리 소녀를 그린 박수근의 ‘길가에서’는 6·25전쟁을 극복한 서민의 고단함을 화강석 같은 질감으로 포착한 수작이다.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 역시 6·25전쟁이 끝난 1954년 황소를 모는 자신과 달구지에 타고 있는 부인 및 두 아들의 나들이 장면을 경쾌한 필치로 그린 걸작이다. 완벽한 구도와 뛰어난 색감이 가족 사랑의 깊이를 돋보이게 한다. 김환기의 ‘여인과 매화와 항아리’, 박항섭의 ‘가을’, 김인승의 ‘도기를 다루는 소녀’, 김기창의 ‘보리타작’, 김흥수의 ‘길동무’, 최영림의 ‘동심춘심’ 등도 흰 저고리와 도자기 등을 소재로 한민족의 내면을 세세하게 다뤘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인물화에 점차 변화가 감지된다. 예술의 본질을 향한 열정은 물론 자신의 감정과 시대적 현실을 캔버스에 녹여낸 게 눈에 띈다. 담배 피우는 여성의 옆모습을 그린 천경자의 ‘탱고가 흐르는 황혼’, 보리밭에 앉은 벌거벗은 여성을 잡아낸 이숙자의 ‘보리밭 누드’ 등은 화가의 내밀한 감정을 투사한 시대의 초상으로 읽힌다. 이종구, 오윤, 임옥상, 황재형 등 1970~19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지켜본 작가들의 작품은 일하며 땀 흘리고, 때로는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 시대적 감성을 자극한다.
유 전 청장은 “근현대 미술의 성장과 발자취를 이처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는 없었다”며 “근현대사를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시는 내년 3월 1일까지.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