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세, 1997~2001년 사이클과 비슷…내년 韓 주식시장 유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용구 하나금투 수석연구원
"세계증시 주도권, 신흥시장 이동"
"세계증시 주도권, 신흥시장 이동"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원(사진)은 24일 “내년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글로벌 증시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신흥시장에서 거시건전성이 양호한 한국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2015년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글로벌 장세가 1997~2001년과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기간의 공통점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증시와 거시경제 흐름 △정보기술(IT) 관련주가 주도주인 점 △미 중앙은행(Fed)의 통화긴축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심화 등이 꼽혔다.
1997~2001년은 ‘닷컴버블’이 형성되던 시기였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가, 중국은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한국은 반도체주가 증시 주도주가 됐다.
또 2001년 미국 9·11테러로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됐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냉각이 있었다. 미 Fed는 1999년 6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부터 긴축기조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총 아홉 차례 금리를 올렸다. 다만 Fed는 지난 7월 말부터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또 미·중 간 1차 협상이 타결로 마무리되면서 사이클은 바뀌고 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내년 말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반면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엔 미국 등 선진국 시장보단 중국 등 신흥시장이 투자자들에겐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은 대외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먼저 조정받는 시장이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이 있지만 회복장에선 이런 특성이 오히려 촉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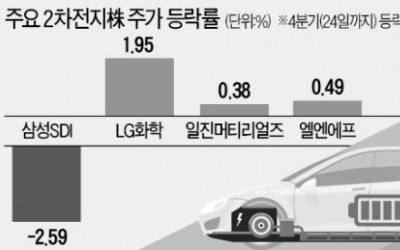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