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일협상 지금도 참고할 만"
脫냉전시대 '자국 이기주의' 팽배
"상대를 안다 착각말고 국익 지켜야"

이준규 신임 한국외교협회장(66·사진)은 지난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관은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피지기(知彼知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3일 한국외교협회 제22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1978년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관이 된 뒤 2017년 주일대사로 퇴직할 때까지 40여 년간 직업외교관으로 일했다. 주뉴질랜드대사, 주인도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주일대사로 일한 그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온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역설적으로 한·일 관계는 가장 미래지향적이었다”고 회상했다. 한·일 어업협정 체결, 일본 대중문화 개방,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은 역사적 순간이 그때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외교부 내 일본 전문가를 뜻하는 ‘재팬 스쿨’은 아니었지만 1996년부터 2년여간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을 지켜봤다. 그는 “위기 속에서 아픈 과거사를 극복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상을 그린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은 지금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주일대사 부임 전 주인도대사로 3년간 근무했다. 당시 차관급에 해당하는 외교안보연구원장이었던 그는 주독일대사를 마다하고 인도로 향했다. 주인도대사에 차관급이 간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재임 중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한을 성사시켰다. 이 회장은 “한국이 중시하는 4강 외교에 인도를 넣어 ‘5강 외교’를 해야 한다”며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잠재력이 큰 만큼 한국과 협력할 현안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날이 갈수록 외교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평가다. 그는 “냉전 시대엔 자유국 진영이란 이유로 국제무대에서 100% 지지를 받았지만 냉전 이후 시대엔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며 “희망적 관측이나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는 1973년 출범해 전·현직 외교관 200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외교전문가 집단이다. 이 회장은 “외교부를 포함해 정부의 외교·안보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제언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젊은 외교부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10명 안팎의 현직 젊은 외교관과 ‘번개 모임’을 열어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는 등 수시로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협상으로 국익을 지켜내는 노련한 직업외교관은 한 명 한 명 모두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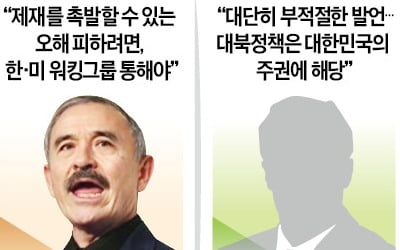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76437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