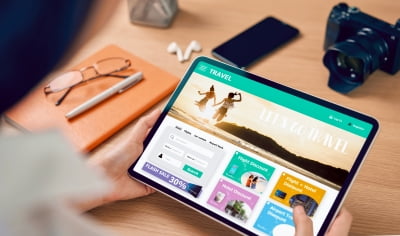소비자 편익 최우선하는 정책 펴야
오상헌 경제부 차장

얼마 전 한 모임에서 만난 대기업 고위 임원 A씨가 대뜸 내기를 제안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기업인들의 숨이 턱턱 막힌다는 얘기를 하던 참이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동석자들의 반응에 A씨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지금까지 정치권과 정부가 어떻게 해 왔는지 보지 않았느냐”고 타박하더니, 10년 전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얘기를 꺼냈다.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며 2주일에 하루씩 마트 문을 닫도록 하고, 심야영업도 금지한 바로 그 규제다.
지금 쿠팡 티몬 등 대형 온라인몰의 힘은 10년 전의 대형마트보다 훨씬 세다. 2018년 온라인쇼핑몰 판매액(111조8000억원)은 대형마트(33조5000억원)를 압도했다. 그런 만큼 10년 전 대형마트를 영업규제한 논리대로라면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몰도 심야에는 접속을 차단하고, 2주일마다 하루씩 ‘오늘은 접속 차단일입니다’를 메인화면에 올려야 마땅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
한 동석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게 한다고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몰을 찾는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 전통시장에 갈 리 없다. 정책 효과가 없는 게 뻔한데 정부가 강행하겠느냐.”
A씨의 재반박. “정치권이 언제 정책 효과를 따졌나.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피해 입은 서민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들이 노리는 진짜 효과 아니냐. 정치권과 정부가 진정 규제의 실효성을 따진다면 지금이라도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줘야지. 전통시장 상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증명됐으니까.”
다른 동석자가 “소비자 반발 때문이라도 대형 온라인몰 영업규제는 못할 것”이라고 하자, A씨는 승차 공유업체 ‘타다’ 사례를 꺼냈다. 타다 덕분에 소비자의 교통 편익이 높아지는 것보다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가 볼 피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판단 기준’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였다.
A씨는 타다 규제는 대형마트 규제와 근본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있는 ‘침입자’의 출현에 시장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기존 영세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정치권과 정부가 침입자를 혼내줬다는 점에서다. 그럴 때마다 소비자 권익은 뒷전이었다. ‘소비자 패싱’이다.
A씨는 “말 없는 다수의 이익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소수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상충되면 정치권은 언제나 목소리 큰 쪽의 손을 들어줬다”며 “시장 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언젠가 ‘대형 온라인몰 때문에 못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면 정말 코미디 같은 규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했다.
듣고 보니 그랬다. 자타가 공인하는 의료 강국이자 정보기술(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원격의료가 한 발짝도 못 나간 것이나, 남들은 다하는 공유경제가 지지부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소비자 패싱’에서 비롯됐다.
올해는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이 법 4조3항은 소비자의 기본권리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언제쯤 빼앗긴 기본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ohyeah@hankyung.com


![[편집국에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부동산 시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07.21522932.3.jpg)
![[편집국에서] 디테일이 아쉬운 스마트시티 정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07.21244658.3.jpg)
![[편집국에서] 세계는 지금 집값과 전쟁 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07.2043661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