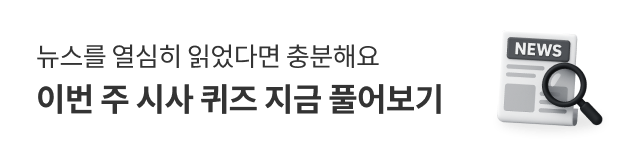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아버지와 나와…' 네 번째 출연
원 캐스트로 한 달 내내 무대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그들은 “우리끼리 농담으로 ‘대학로 방탄노년단’이라 한다”며 “생동하는 무대의 매력에 여전히 푹 빠져 있다”고 했다. 신구는 “무대에선 배우와 관객 사이에 기계가 끼지 않는다”며 “내 호흡을 관객들이 그대로 느끼고 함께 교류하는 희열이 크다”고 설명했다. 손숙은 “같은 작품이라도 관객은 매일 바뀐다”며 “한 공간에서 매번 다른 관객을 만나는 공연의 매력은 어떤 장르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배우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1971년 연극 ‘달집’에서 처음 호흡을 맞췄다. 이후 39년 만인 2010년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 함께 출연했다. 2015년 ‘3월의 눈’, 2017년 ‘장수상회’에서도 잇따라 만났다. 손숙은 “무대에 함께 서면 편안하다”며 “눈빛만 봐도 서로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구에게 손숙이 “나는 신뢰 안 해?”라고 묻자, 신구는 “신뢰하지”라며 너털웃음을 지어 보였다. 오랜 세월 무대에 오른 두 배우는 이제 요령껏 연기할 법도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다. 손숙은 “신구 선생님은 지금도 연습 첫날부터 대본을 놓고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본을 보고 있으면 연습이 제대로 안 된다고 아예 전부 외워 오는 거죠. 그걸 본 젊은 후배들은 엄청 긴장하고 저도 마음이 막 급해져요.”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는 2013년 초연 이후 네 번째 출연이다. 한 역할을 여러 배우가 맡는 형식이 아니라 오직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원 캐스트로 한 달 내내 무대를 이어간다. 젊은 배우들조차 하기 힘든 강행군이다. 두 배우는 “더블 캐스트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원 캐스트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품에서 신구는 간암 말기에 정신착란증까지 겪는 아버지 역을, 손숙은 가족을 위해 한평생 희생한 어머니 역을 맡았다. 신구는 정신착란증을 연기할 때도 감정을 지나치게 이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선 오히려 극을 제대로 끌어갈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한 겹의 이성을 갖고 있어야죠. 감정 몰입과 이성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인 채 잘 유지하는 게 좋은 배우라고 봅니다.”
네 번째 공연이지만 연기할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감정들도 있다. 손숙은 큰아들에게 전화한 작은아들을 혼내는 장면에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감정을 깨달았다. 큰아들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번듯한 직장도 얻은 반면 둘째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모들은 큰아들에게 더 잘해줬다. 하지만 둘째가 형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아프다. 언제 올 거냐”고 묻었을 때 “다음달에 간다”는 냉담한 답을 듣게 된다. “엄마는 그걸 알고 둘째한테 왜 전화했냐고 화를 내요. 여기엔 큰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담겨 있죠. 지난 공연 때까진 그 복합적인 감정을 놓쳤었는데 이번엔 그게 절절히 와닿더라고요.”
“무대 오래 서고 싶어…대사 없어도 좋아”
많은 무대에 올랐지만 아직 해보지 못한 역할도 있다고 했다. 신구는 “젊었을 때 햄릿을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며 웃었다. “개성있는 햄릿도 있으면 좋은데 당시 연출들이 너무 정석대로 했어.” 손숙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여주인공 블랑셰를 맡고 싶었는데 이젠 지나간 꿈이 됐다”고 했다. “그래도 비교적 좋은 역할을 많이 한 편이에요. 이제 특별히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기보다 그저 무대에 오래 서고 싶어요. 심지어 대사가 없어도 좋아요.”
국내 연극계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손숙은 “무용과 국악은 실력과 경력이 쌓이면 인간문화재로 인정해 주는데 연극계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립극단에서 명예 종신단원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여섯 분만 그렇게 모셔도 젊은 배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이 될 겁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