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엔 '꿈의 직장' 금융맨엔 '저승사자'
5700개 금융사 검사·감독
인사·예산은 금융위 통제받아

올초 조직 개편을 마친 금감원은 62개 부서(40국 22실)를 두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관련 기관은 5700개에 이른다. 금융지주(10개), 은행(55개), 보험(60개), 증권·자산운용·사모펀드 등의 금융투자부문(1671개), 저축은행·카드·대부 등의 중소서민금융부문(3663개) 등 금융권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자본시장이 커지고 핀테크(금융기술) 창업도 늘면서 검사대상 기관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직원은 1981명. 명함을 받아보면 변호사(138명), 공인회계사(413명), 보험계리사(43명), 박사(61명) 같은 ‘고스펙’이 흔하다. 전체 직원 중 44.8%(900명)가 전문직이다. 19.2%(385명)는 외부 경력직이다. 금감원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858만원, 신입사원 초봉은 연 4392만원이었다. 윤석헌 원장은 2억954만원을 받았다.
해마다 9월께 시작하는 금감원 공채는 30~6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은 조사역(5급)으로 입사해 선임조사역(4급), 팀장·수석조사역(3급), 국·부국장(2급), 국장(1급) 순으로 올라간다. 2~3년마다 부서를 옮기는 게 관행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단기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기능별 직군제’를 도입해 분야별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모두가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지만 내부적으론 인사적체와 업무부담이 심해져 고민이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후 금감원은 4급 선임조사역부터 퇴직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선배들이 나가질 않으니 승진이 힘들고, 이직도 자유롭지 않다는 게 젊은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금융위와 마찰이 심했던 2018~2019년에는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는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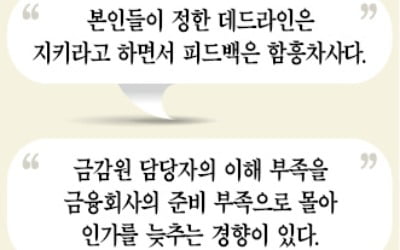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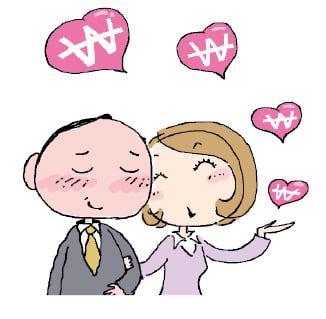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7643756.3.jpg)

